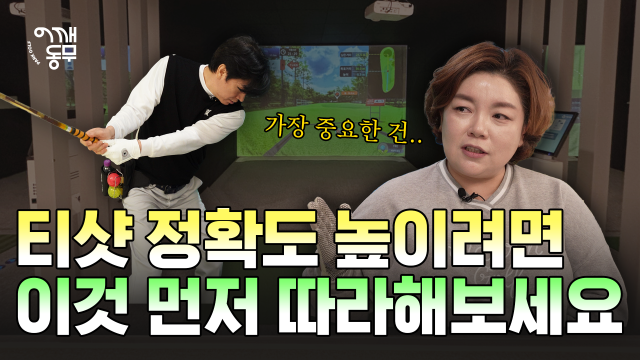환경부가 3년 만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형태의 집단 합의를 이끈다. 관건은 3년 전에도 합의를 막은 합의금과 책임 범위에 대한 기업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는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방향 보고서를 보고했다.
가습기살규제 사건은 2006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환자 발생으로 시작됐다. 이후 두 차례 정부 조사 끝에 2011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를 폐손상의 원인으로 규명했다. 2017년 8월 사회적 합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피해 구제가 속도를 냈다. 정부는 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의 피해구제 자금은 약 2725억 원에 이른다. 작년 6월에는 대법원은 이 사건의 국가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2011년 이후 피해 구제 신청자 5983명 가운데 5828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과 달리 피해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은 기업 상대로 소송 합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의 승소나 합의 도달이 쉽지 않다”며 “기업은 집단합의 추진에 찬성하지만, 합의금 총액과 기업간 분담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2022년 먼저 시도됐던 집단 합의는 무산됐다.
환경부는 피해자, 기업,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기업간 적정 분담금 분담비율,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이 담긴다.
김 장관은 “사건이 14년 지났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하고 관련 협의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