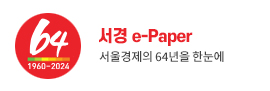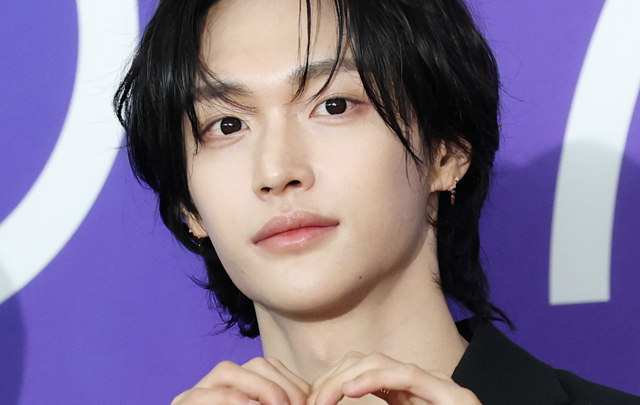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관세 폭격에 이어 환율과 금융 시스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티븐 미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정책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환율 정책도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저평가된 타국 통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으며, 플라자합의와 같은 다자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다. 관세 폭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 인위적인 환율 조정과 새로운 글로벌 합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관세 폭격 이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관세 부담을 무역 상대국이 지도록 했다. 2018~2019년 17.9%의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은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13.7%)를 유도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4.1%로 억제했다. 결국 관세 부담을 중국이 떠안은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 관세 부담을 무역 상대국에 전가할 뿐 아니라 미국의 채권 보유국들에 기존 보유 채권을 100년 만기 채권이나 영구채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투자 압박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이달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 경제사절단에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의 투자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 하한선이 아니라 미국 측의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국 이익 우선 기조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관세에 이어 투자·환율·금융 등으로 이어지는 트럼프의 압박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범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한미 윈윈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고, 제조업뿐 아니라 환율 및 금융 시장에 닥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교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