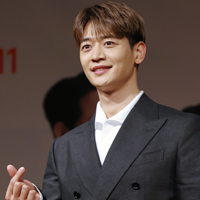적지 않은 분들이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킨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한다. 개정안의 내용도 ‘이사는 소액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으니 일견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인 대주주에게 사실상 경영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이유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포장돼 있지만 결과는 기업을 일궈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꺾고 경제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공기업과 준공기업만 주식 발행을 통해 살아남는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경제로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의 주 내용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경영 참여 금지’라고 정의해야 한다.
법안에 대주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왜 개정안의 핵심이 대주주 경영 참여 금지인지는 현실을 고려해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한 개인이 자기 돈과 친분 있는 사람의 돈으로 회사를 세웠다가 더 큰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투자자를 소개받아 출자를 받게 되면 대주주는 소액주주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만약 직원 중에 한 사람을 회사 대표로 세웠다면 그는 더 이상 대주주의 말을 듣지 않고 소액주주가 하라는 대로 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대표를 해고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는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스타트업에 개정 상법이 적용되면 젊은 창업가는 더 이상 벤처캐피털(VC)로부터 펀딩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출자를 받은 후 VC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창업가는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돈과 노력·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소액주주가 들어오면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동업자였던 것처럼 우대하면서 경영의 중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아무도 회사를 키우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혁신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할 때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의견이 상충될 때 주주총회에서 해결하고 이사는 주총에서 결정된 사항만 잘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소액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면 주주 간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사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아마 이사회는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 주총을 열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민간인 대주주는 경영에서 사퇴하고 전문경영인이 정부와 펀드·노조와 협의해 경영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앞으로 대기업집단과 같은 소유 경영 기업은 법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은 창업자와 가족을 배제한 전문 경영 기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미국은 구글·애플이나 메타·엔비디아·테슬라 같은 소유 경영 기업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를 견인하면 IBM·GM·인텔 같은 전문 경영 기업이 뒤를 따라 대형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키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을 개정해 소유 경영 기업을 없애자고 한다. 이러한 상법 개정은 일반인도 우려하지 않을까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