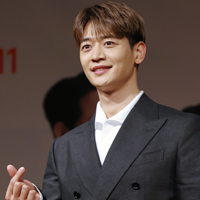지난번에 제주인에 대한 ‘출륙 금지령(1629년 8월)’을 설명하며 일본이 1609년 유구를 병합한 일을 언급했다. 일본 사쓰마번의 시마즈씨가 막부의 허락을 받고 3000여 명의 군대로 유구를 침공한 것은 1609년 3월의 일이었다. 이후 유구는 중국과 일본에 모두 복속되는 ‘중일 양속(兩屬)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는 명-유구-일본 사이에서 조선을 외교적인 곤경에 빠뜨렸다.
그 시작은 일본의 팽창성에 대한 명의 심각한 우려에서 시작한다. 당시 명은 일본의 지도층이 명의 충실하면서도 ‘공순’한 양대 조공국인 유구와 조선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회유해 명과의 통공(通貢)을 탐낸다고 판단했다. 1612년 음력 6월 7일 절강총병관(浙江總兵官) 양숭업(楊崇業)이 황제에게 상주한 내용이다. 10여 년 전 임진왜란의 발발과 원군을 조선에 파견해 섬나라 일본의 ‘위력’을 경험했던 명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우려였다.
다만 남쪽으로 유구 병합을 통해 복건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북쪽으로 쓰시마를 통한 조선 루트로 명에 접근한다는 인식이 문제였다. 이에 명은 조선 국왕에게 일본인의 전라·경상도 진입을 엄금하라고 명령했다. 1609년 일본의 유구 병합으로 인한 불똥이 조선 국왕에게 과도한 일본인 진입 경계령으로 튄 것이다. 마침 1609년은 조선이 일본 쓰시마 측의 끈질긴 외교 관계 회복 노력을 받아들여 기유약조를 체결하며 일본과의 교류를 재개하려던 참이었다.
이에 조선은 명과의 사대, 유구와의 교린,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세 가지 외교 노선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버거운 상태가 돼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리’를 깨뜨린 인물로 제주목사 이기빈이 희생양이 됐고, 유구 왕자를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조선과 유구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명분을 제공했다. 또한 1629년 시행된 ‘출륙금지령’은 제주와 유구 사이의 물리적 장애 요인으로 기능했다. 당시 조선은 유구와의 교린을 포기하는 대신 명과의 사대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선택한 셈이었다. 조선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외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