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실패’라고 할 때 떠오르는 말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위기(危機·위협이지만 기회이기도 함)’ 등이 있다. 모두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간 ‘실패 빼앗는 사회’는 특이하다.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인 데 그럼 ‘실패 권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말인가.
책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에서 2021년 설립한 독특한 이름의 ‘실패연구소’가 3년 동안 카이스트 학생들을 비롯해 학교 안팎으로 세대와 분야를 넘나들며 ‘실패에서 배우는 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험한 결과를 담고 있다. 실패연구소는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어려운 데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의지나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단순한 실패 의무화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실패 경험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성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실패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진짜 실패를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일류 이공계 대학인 카이스트는 여러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프로젝트 성공률 99%’도 있었다. 거의 모든 연구가 성공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노벨상’은 따 놓은 당상인가. 아니라고 한다.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 연구자들이 실패하지 않을 연구만 했다고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 카이스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과 더 나아가 우리 시대 청년들의 현실이다.
2021년 2월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한 이광형 교수는 “성공률이 80%가 넘는 연구 과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했다. 과학자들이 두려움 없이 전례 없는 도전에 매진하려면 역설적으로 실패를 거듭해도 끊임없이 재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철학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2021년 6월에 문을 연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도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실패를 하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올타쿠나’하고 실패하지는 않는다. 실패연구소는 일단 여론조사를 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조사에서는 ‘실패가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절대 다수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교훈을 따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실패를 각오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회피하겠다’는 의견이 오히려 다수였다. 실패자라는 사회적 편견이 무섭다는 이유에서다. 즉 실패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실패한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저성장·양극화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실패연구소는 시행착오 끝에 해답을 얻었다. 이 책의 주제다. 우선 결과적으로 성공한 ‘승자’의 실패 이야기나 교훈을 직접 전달하는 대신,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실패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얻은 배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각자 이런 실패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실패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임을 받아들이고 심리적 위축감과 수치심을 완화할 수 있었다. 결국 실패연구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더 나은 성공을 배울 수 있다는 취지다.
“실패연구소가 어렵게 찾아낸 ‘실패에서 제대로 배우는 법’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하고자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성비 높은 안정적 성공만 추구하는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결코 실패라는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패할 시간과 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 사회 전반에 관점의 전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다.” 1만 85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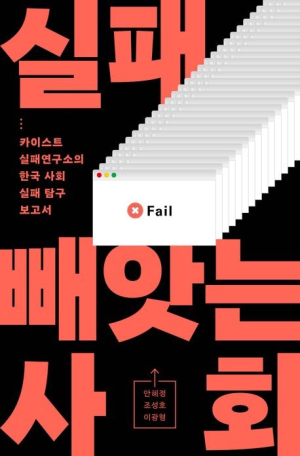
 chsm@sedaily.com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