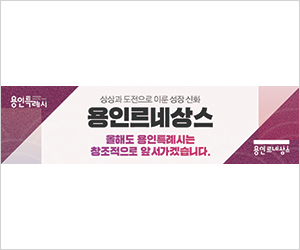“우리 이제 제대로 된 일 좀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달 4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계엄’과 ‘탄핵’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지난 122일간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며 투쟁을 이어온 의원들에게서는 이제야 꿈꿔왔던 ‘국회의원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느껴졌다.
이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정치권에는 대결의 언어가 여전하다. 탄핵 찬반으로 극한까지 대립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말 그대로 여야 없이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할 시기지만 나라 안팎의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공허한 갈등의 언어만 오가고 있다.
민주당 내 소위 ‘정책통’ 의원들에게 대선 승리 전략을 물어도 종종 “이번 선거에서 정책 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아직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만큼 지난 22대 총선처럼 ‘정권 심판론’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6·3 대선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치러진다는 점은 ‘네거티브 대선’ 우려를 키운다. 60일은 다양한 계층의 민심을 듣기에도, 청년·노동·부동산 등 사회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여론을 형성하기에도 턱없이 짧다. 민주당에서는 전국을 돌며 흥행 분위기를 띄워야 할 경선 기간에 강원·제주 지역 등은 그야말로 ‘찍고 오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탄핵 찬반을 두고 서로를 적대시했던 광장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점 역시 후보들의 네거티브 유혹을 부추길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때도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가 서로에 대해 여러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미 많은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에서부터 상대 후보의 “12가지 죄목(김문수)” 운운하며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가 왜 안 되는지’를 역설하는 모습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회복의 언어가 필요하다. 당장 몇 주 전 여러 의원들이 찾은 산불 피해 현장에서 집이 잿더미가 됐다며 눈물을 흘린 이재민들에게 ‘내란 종식’ ‘이재명 심판’이란 붕 뜬 구호일 뿐이다.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 유권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정치권이 시민들의 삶에 와닿는 고민을 하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