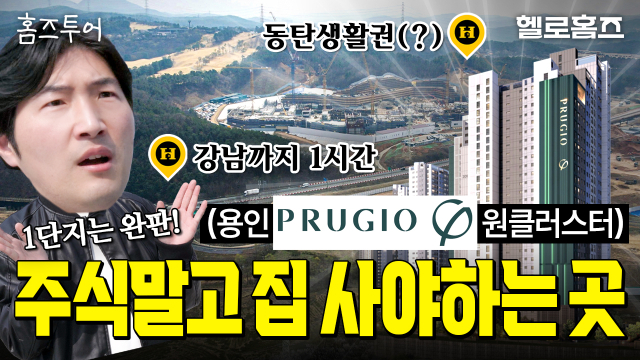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제약 산업의 맹주로 떠올랐다. 국내 업계에는 체념의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경쟁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 제약 산업에 양적·질적 성장 가속도가 붙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와 14억 명의 인구를 무기로 대규모 임상을 빠르게 진행해 신약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국산 신약 허가가 2개에 그쳤을 때 중국은 40개의 신약을 허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개수다.
물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서 ‘속도전’은 양날의 검일 수 있다. 빠르면 30일 내 임상시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중국 당국의 규제 수준과 중국산 신약 효능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각국의 신약 승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중 간 단순 비교는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리얼 월드 데이터(처방 데이터)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약의 효능과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빠르게 쌓아 연구개발(R&D)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본국에서 신약 허가받은 것을 레퍼런스로 삼는다”며 “중국의 속도전은 향후 FDA 승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만큼의 인적·물적 자본을 신약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을 ‘똘똘한 약 하나’에 투입해 제대로 키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블록버스터 약물(연 매출 1조 원) 후보로 꼽히는 유한양행(000100)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SK바이오팜(326030)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대표적이다. 약의 효능뿐만 아니라 경쟁 약물과 시장의 미충족 수요 등을 분석해 ‘팔릴 만한 약’을 골라내 적극 개발해야 한다. 알짜배기 신약으로 중국을 따라잡는 K바이오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indmin@sedaily.com
mind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