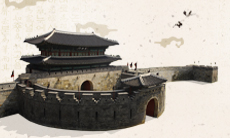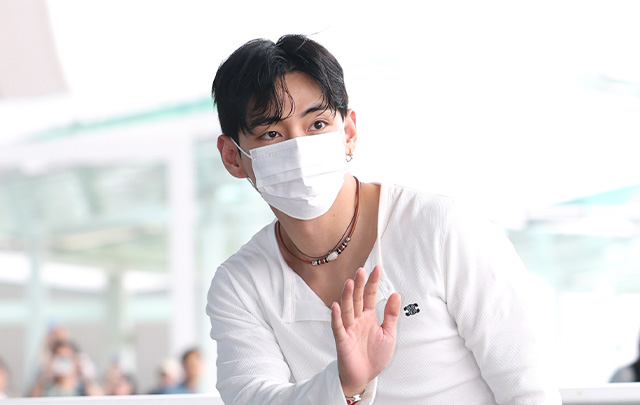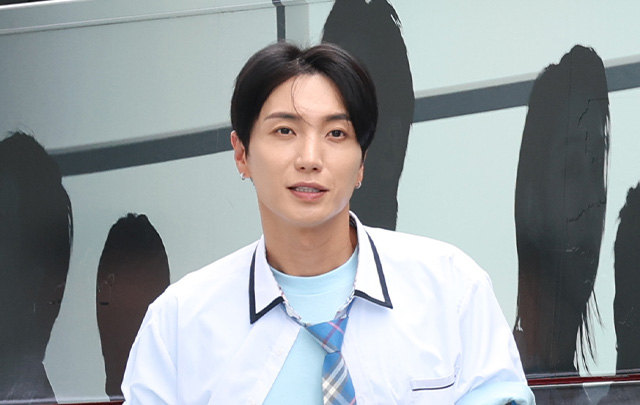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전 세계 산업계를 공포에 떨게 하며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존심을 접고 중국과 무역 협상에 나서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사실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통해 글로벌 패권을 장악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투자의 결과다. 1992년 내몽골자치구를 방문한 덩샤오핑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中东有石油,中国有稀土)”라는 명언은 남길 정도로, 중국은 일찍이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하고 차곡차곡 준비해 왔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에 있어 독보적인 세계 1위다. 분리·정제·가공하는 과정 등 가치사슬 공급망 전체도 지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파고 들면서 대미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희토류는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 자원으로도 꼽힌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매장량은 베일에 가려 있지만 북한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희토류 글로벌 생산량은 39만t이다. 2018S년(13만2000t)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1위 생산국은 단연 중국이다. 27만t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뒤이어 호주, 미국, 미얀마, 러시아 등의 순이다. 생산량은 2위인 호주의 경우 중국 대비 10%도 안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희토류 매장 규모는 글로벌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다.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가 매장량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추정치는 다소 큰 편차를 두고 엇갈리지만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상위권이라는 관측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당장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0만~ 4800만t가량이 북한에 매장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최대치가 근접하다면 북한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희토류 보유국으로 올라선다. 최소치 역시 세계 4위로 작지 않은 규모다.
일각에서는 북한 희토류 매장량이 현재 글로벌 수준을 10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반도 광물자원개발(DMR) 융합연구단은 2016년 6월 북한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도 일대에 희토류가 20억t가량 매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글로벌 매장량 전체(1억 2000만)의 16배가 넘는 양이다.
앞서 2014년에는 영국계 사모펀드(SRE미네랄스)가 북한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평안북도 정주 지역 희토류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며 파악한 매장량만 2억1600만t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측일 뿐 현실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희토류협회는 중국 내 미확인 희토류가 1억t 규모라고 추정·발표하면 논란이 일었다.
매장량은 그렇다 치고 관건은 매장된 희토류의 상품성이다. 매장량이 많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 BBC방송은 “희토류는 채굴과 분리, 정련, 합금화 등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과 장시간 축적된 기법이 필수적이고 공해물질이 많이 발생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것 보다는 과연 그 희토류들의 품질이 얼마나 쓸만한 지, 상품성이 있는 지에 따라 희소성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매장량이 많더라도 품위(광물 내 유용한 성분의 함량)가 높아야 경제성이 있다”면서 “북한 희토류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탐사·검증이 선행된 이후 상품성과 희소성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희토류가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숙제가 있다.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 석탄과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 상당수 북한산 광물이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것처럼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분명한 건 북한이 많은 매장량의 희토류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대북제재 해제가 수월해질 수 있고, 지하 자원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높은 남한과 손잡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북한의 희토류의 상품성은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