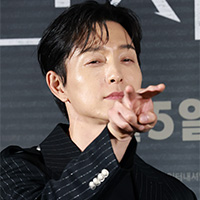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지난 8월 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주한미군 기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요한 것은 병력 등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력을)고정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성이 낮다(militarily expedient)고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역할과 임무 재조정 문제가 주의제로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수장이 미군 병력 감축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캠프 험프리스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특히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령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현재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은 언제든 감축 될 수 있기에 남게 되는 주둔 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첨단 전력을 확보해 역량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정치인도 아닌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4성 장군인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명확한 찬성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태세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 배경(중국 견제 완화 및 제2 도련선 재배치)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제1도련선은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지역이다.
보고서는 우선 비용 측면만 살펴보면, 미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가 미국 본토와 유럽, 일본, 한국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유럽→ 일본→미국본토→한국 순이다. 공군은 유럽→일본→ 한국→ 미국 본토 순이다. 대부분이 육군인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에 있는 것 보다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것이다.
동맹 전체의 기여도를 봐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비용분담 인덱스 스코어에서 ‘Tier A’에 속하고, 비용분담 비율에서 ‘Tier 1’에 포함된다. 가장 우수한 동맹국 그룹인 ‘Tier A-Tier 1’ 그룹에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동맹국 35개국 중 미국 입장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동맹국 그룹(‘Tier C’와 ‘Tier 3’)의 해당되는 국가의 숫자가 16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비용분담 인덱스 스코어(Burdensharing Index score)에 따라 동맹국을 3개 그룹(Tier A~C), 비용분담 비율(Burdensharing ratio)11)에 따라선 3개 그룹(Tier 1~3) 분류한다.
이 같은 까닭에 보고서는 1기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주한미군 감축론의 대두는 비용 문제가 핵심 이유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보고서도 비용 문제보다는 주한미군 전력의 ‘생존성’을 문제 삼으면서, 중국군과 너무나 근접해 있고 분산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방우선순위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제1 도련선에서 물러서 제2 도련선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오키나와에 배치된 주일미군도 일부 괌으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8월 말쯤 나올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분명한 건, 미 안보커뮤니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해 서둘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상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가 그것을 최대한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비롯해 주일미군을 기존 보다 뒤로 빼는 것은 명백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중국의 대(對견제)에 약점으로 작용할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어 미 상·하원에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 주한미군 3만7000명에서 최근 2만 8500명으로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었고 단계적인 주한미군 감축은 순수”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인상 주장이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인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