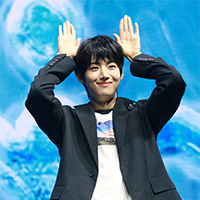최근 군 관사와 관련한 보도가 세간의 화제였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강뷰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된다. 물론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낸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다.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있다.
이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진 매달 160만 원, 이후엔 월 240만 원이다. 주변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 가격에 한참 못 미친다. 이처럼 책정한 퇴거 지연 관리비(벌금)가 인근 시세보다 낮아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앞선 보도와 전혀 다른 매우 열악한 군 관사 자료가 나왔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육군의 관사 대기자는 2957명, 해군은 74명, 공군은 206명, 해병대는 115명 등 육·해·공, 해병대에 관사가 부족해 대기인원은 3352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000여 명이 넘는 군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가족과 떨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육군 관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3063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8월 기준 대기자는 2900명으로 줄어지만 수개월을 기다려도 관사 배정은 감감무소식이다.
미혼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혼 간부들을 위한 간부 숙소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1월 대기자는 743명이었지만, 7개월이 지나 8월 기준으로 2280명으로 오히려 3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최근 만난 육군에서 20년 근무한 김 상사는 “수도권 인근으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나와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기 위해 관사 신청을 했는데 너무 놀랐다.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육군 전체적으로 3000명 가까이 대기자가 있고 자신은 거의 마지막 번호”라고 했다.
육군 3개월 이상 장기대기자도 1800여명
육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해병대의 간부 숙소 부족이 심각했다. 1월 대기자가 47명에서 7개월이 지나 8월 기준으로 563명으로 무려 12배가 급증했다. 해군과 공군도 8월 기준 간부 숙소 대기자가 각각 201명, 219명에 달했다.
심지어 3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 규모도 상당하다. 육군은 1829명, 공군은 215명, 해병대 20명에 이른다. 공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전체 군 관사 보급률이 76% 수준인 탓에 수도권의 경우 69%에 머물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배치된 장교·부사관들이 민간 전·월세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체 관사 소요는 8만 6023세대였지만 실제 보유 세대수는 6만 5382세대에 불과해 보급률이 76%에 그쳤다.
군별로 보면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는 99%로 사실상 수요를 맞췄다. 하지만 육군은 75%, 해군·해병대는 60%, 공군은 80% 수준이었다. 병력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과 해군에서 주거난이 심각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수도권 보급률은 69%(육군은 66%, 해군·해병대는 63%)에 머물렀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평균 82%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국직 부대는 소요보다 많은 117%의 보급률을 보였다.
임종득 의원은 “군 간부들과이가족들이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위원장도 “군 간부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관사 정책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력 유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