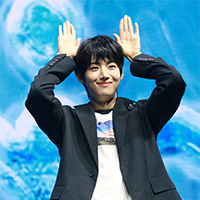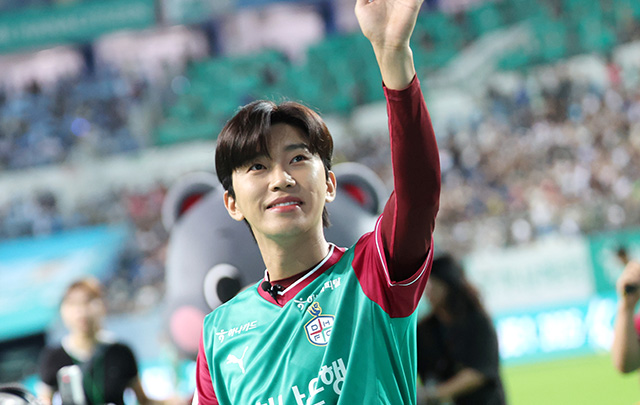주택건설사업에서 개발사업자가 평균 5회가량의 사업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연과 관련 피해를 호소한 사업자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연구원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건수 26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변경차수가 4.9회에 달했다. 가장 많이 변경한 사업은 무려 22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균 5회가량 변경되면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도 전체 사업자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개발사업의 71%는 3개월에서 1년가량 인허가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는 인허가 종료 기간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지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으로 따른 비용 증가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업의 70%가량이 이 같은 인허가 지연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0~100억 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평가했다.
인허가 지연은 주로 지자체의 심의 절차와 행정판단, 기부채납 이견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공간연구원이 파악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A오피스텔은 건축심의 조건으로 과도한 조경을 요구하며 인허가가 지연됐고, B오피스텔은 기부채납(도로)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 또 수도권 한 물류 단지는 개발행위 완료 이후 건축허가과정에서 지자체가 구역 이외의 진입도로 설치를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기도 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에 지자체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적극 행정,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의 국토부 소관부서 위주의 유권해석을 탈피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 담당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