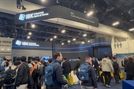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한다는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의 이 말에는 어느새 몸에 밴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확산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 없이 아내와 둘이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마리 관장은 자신의 일상을 “아주 평범하다”고 말한다. 주말이면 아내와 산책도 하고 고궁과 박물관도 찾는다.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고 작가들도 틈틈이 만난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기관의 수장이기에 평범하지 않은 평일”은 치열하다. 스스로 “나는 가장 현실적인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마리 관장은 하루 6~10개에 이르는 회의의 연속에서 생활하고 큐레이터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토론한다. 외국인 관장이 부임한 후로 미술관 직원들의 영어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었다.
아쉬운 점은 너무 바쁘다 보니 한국어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 어문학에 관심 많은 마리 관장은 라틴어를 비롯해 이미 8개국어에 능통하다.
“한국어 공부가 즐겁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천천히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통역을 거치다 보니 대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서 시간 낭비 없게 핵심만 말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통역과정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마술과 같은 것이라 지금은 한국어 대화를 들으면 주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머잖아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 두고 보십시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