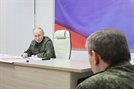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감동의 공연 뒤엔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관객의 박수와 아티스트의 감사 인사가 어우러진, 막 내린 뒤 다시 시작하는 또 다른 무대. ‘커튼콜’은 객석의 뜨거운 환호와 특별한 ‘서비스 공연’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화려한 피날레’를 펼쳐 보인다.
커튼콜(Curtain call)은 무대와 객석이 서로 건네는 감사 인사다. ‘막이 오르다·내리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커튼(장막)은 공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치다. 커튼의 유무와 상관없이 퇴장했던 연주자 혹은 성악가·배우·무용수를 다시 불러내(call) 인사를 나누고 앙코르 무대를 감상하는 시간을 통칭해 커튼콜이라 한다.
클래식 공연은 퇴장한 연주자가 관객 박수로 통상 두세 번 무대에 불려 나온 뒤 미리 준비한 앙코르곡을 선사한다. 공연의 질이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관객 대부분이 연주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커튼콜 박수를 쳐주는 편이지만, 인기 공연의 경우 첫 번째 앙코르 곡이 끝난 뒤에도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추가 곡을 연주하기도 한다. 오페라·무용·뮤지컬 등 여러 명의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공연은 앙상블-조연-주연 순으로 출연진이 무대에 나와 인사를 건넨 뒤 주인공의 메인 아리아나 무용·넘버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쇼 성격이 강한 뮤지컬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해 ‘브로드웨이42번가’의 송일국은 마지막 공연 커튼콜 때 탭댄스를 선보였고, ‘킹키부츠’는 매 공연 대표 넘버의 안무를 관객이 함께 추는 스페셜 커튼콜로 화제를 모았다.
관객의 감동은 신기록도 낳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1988년 2월 24일 베를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주인공 네모리노 역으로 무대에 올라 1시간 동안 무려 165번의 커튼콜을 받았다. 이 전무후무한 기록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요즘 커튼콜 때 손만큼 바쁜 게 스마트폰이다. 감동의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커튼콜 장면을 찍는 관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연 홍보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작품도 많지만, 촬영이 제한·금지된 순간까지 셔터를 눌러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한 클래식 공연장은 최근 이와 관련한 당부의 글을 올렸다. 커튼콜 뒤 이어지는 앙코르 연주까지 촬영하는 관객이 있어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연주 중 터지는 플래시나 ‘찰칵’ 소리는 연주자는 물론 다른 관객의 집중에 방해될 수밖에 없다.
연주자나 배우 모두 긴 시간의 공연에 지친 몸으로 다시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건넨다. 서로에게 벅찬 그 순간은 카메라 앵글이 아닌 나의 눈과 귀, 온몸으로 간직하는 것이 어떨까. 잠깐의 촬영을 마친 뒤 힘찬 박수로 응원을 보내는 게 진정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길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