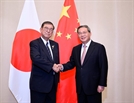2015년 초겨울, 한 어부가 충남 태안반도 갯벌에서 낙지를 잡다 우연히 도자기를 발견했다.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직감한 어부는 썰물 때마다 주변 갯벌을 뒤져 도자기 몇 점을 더 찾아냈다. 감정 결과는 고려청자 진품. 이 소문을 들은 전문 도굴꾼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접근했다. 바닷속 보물을 캐 한몫 잡겠다는 두 사람의 꿈은 청자를 팔아먹는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가 잡혀 물거품이 됐다.
태안해역은 고려 때부터 삼남지방에서 거둔 세곡과 진상품을 운반하는 조운선이 오가는 길목이었다. 그런데 태평해 안락하다는 태안의 지명과 달리 예로부터 난파가 잦았다. 바닷목의 물살이 여간 거칠지 않아서다. 항행이 얼마나 위험했던지 이 해역은 오래전부터 난행량(難行梁)으로 불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4년(1392년)부터 세조 1년(1455년)까지 63년 동안 무려 200척이 침몰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가히 조운선의 공동묘지라 할 만하다.
옛 문헌의 난파 기록은 발굴 유물로 뒷받침된다. 2007년 고려 조운선(태안선 명명)이 발견된 후 지금까지 고려와 조선의 선박 5척이 연거푸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 유물이 국보급 청자를 포함해 3만여점에 이른다. 2007년 첫 보물선 찾기도 주꾸미 그물에 고려청자가 걸려 나오면서 시작됐으니 태안의 바닷속은 수중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전남 강진산 청자가 무더기로 발굴된 신안 앞바다처럼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조상이 거센 조류를 우회하는 인공해로 개척에 나섰다는 점이다. 고려 인종 때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가로지르는 굴포운하의 첫 삽을 떴지만 암반층에 걸려 끝내 완공을 보지 못했다. 안면도는 원래 곶이었지만 조선 인조 때 안전해로 확보차 운하를 파면서 섬이 됐다. 문화재청이 어제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開水祭)를 열고 여섯 번째 태안 보물선 찾기에 나섰다. 낙지잡이 어부의 탐욕에 존재가 알려진 바로 그 배다. 태안 보물선 탐사를 계기로 세월에 묻힌 운하도 함께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그나저나 파나마·수에즈운하는 알겠지만 이보다 수백년 앞서 해로 개척에 나선 선조들의 도전의 역사를 자라나는 후세들은 알는지 모르겠다. /권구찬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ns@sedaily.com
ch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