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공통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는 엘리트 세력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다.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좋은 일자리는 점차 줄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구질구질한 현실은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누가 이토록 숨막히는 사회를 만들었나’ 엘리트 세력은 존경은커녕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엘리트 몰락의 단적인 사례이다.
독일의 사회학자로 엘리트 연구의 권위자인 미하엘 하르트만은 ‘엘리트 제국의 몰락’에서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사법·언론 등을 장악한 엘리트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해온 과정을 분석한다. 백과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엘리트는 ‘가장 뛰어난, 최고의 사람’(바흐리그 독일어 사전),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독일 두덴 사전) 등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저자는 엘리트라는 용어 자체가 나치 정권에서 유래한다고 폭로한다.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만들어 배타적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해왔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4개국의 엘리트는 상위 3~5% 이내의 상류사회 출신으로 각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행정학교·에콜폴리테크니크·파리상업학교 등 3대 명문학교 졸업생이 1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상류사회 출신의 엘리트 대학 졸업생들은 서로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그들만의 견고한 리그’를 만들어낸다. 이 네트워크는 엘리트들이 정치, 경제 등을 독점하는데 활용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생계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공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령 2017년 말 독일 지멘스는 약 3,500명의 일자리를 없애고 공장 3개를 매각이나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조 케저 최고경영자(CEO)는 빈부 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노동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노동자 해고에 대한 엘리트의 무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발언이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주도한 신자유의 정책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 대처는 첫 내각의 각료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명을 상류층으로 채웠다. 노동자 계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레이건 정부에서도 상류층과 중상류층이 각료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지미 카터 전임 대통령 때 노동자와 중산층 출신이 4분의 3이었던 것과 정반대다. 대처와 레이건이 부유층 감세와 시장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됐다.
하지만 소수의 엘리트들이 대다수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주요국에서는 대중들이 기존 정당들을 불신하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후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산시키는 엘리트주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별하고 엘리트 계급의 개방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각각 신자유주의의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의 ‘분수효과’를 내세우며 논리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일독할만한 책이다. 1만6,800원.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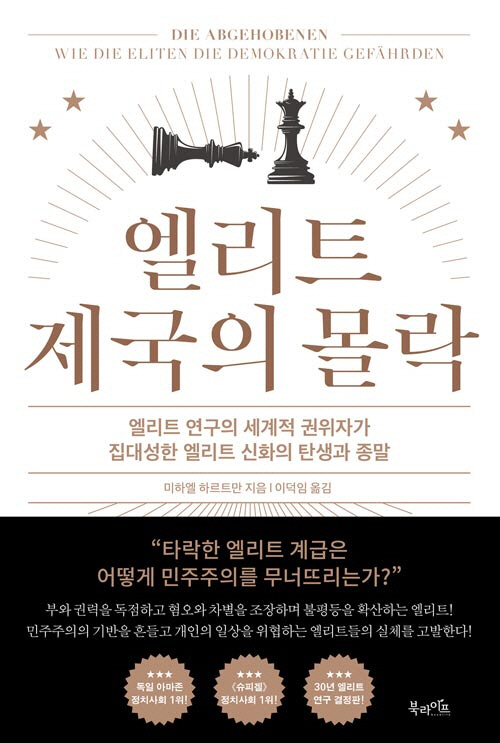

 yeonvic@sedaily.com
yeonv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