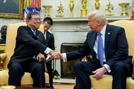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년차 농부다. 지난 2016년 9월 고향에 내려온 첫해는 도토리를 줍고 텃밭을 가꾸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듬해부터 두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도 정책 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월·화·금요일 외에는 농사를 짓는다. 농사 얘기를 꺼내자 “아휴~”하면서 손사래부터 쳤다. “막상 달려들었더니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공부도 하고 농정 경험도 있는데 직접 해보니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했나 자괴감부터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평생 이런 일을 해온 농부들의 심정이 이해되더군요.”
힘들게 일해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 다반사인 게 농사일이다. 가격은 불안하고 판로도 걱정이다. 얼마 전 밭에 심은 고추 모종을 노루가 엉망으로 만드는 바람에 마을 친지에게 구해서 다시 심었다. 관상수를 심었다가 여름 뙤약볕에 반쯤 말라 죽인 일도 있었다. 한 달 전에는 비닐하우스가 비바람에 무너져 내렸다.
심은 작물은 10여종. 논 800평과 밭 2,000여평이 전부다. 농민 1인당 평균 경작면적에 못 미친다. 산자락을 개간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산나물과 도라지를 심었다. 한약재로 사용하는 작약과 고추·마늘 농사도 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850만원쯤을 손에 쥐었다고 한다. 쌀농사로 250만원, 나머지는 의성의 특산품인 마늘 농사로 번 것이다. 순이익이 아니라 일체의 비용을 빼지 않은 순수한 매출. 인건비를 빼면 남은 게 없다.
농사를 지은 첫 계기는 세상살이를 잊기 위해서다. 탄핵 정국에 뉴스를 끊었다. 그러다 이왕 농촌에 사니 평생 말로만 하던 것을 실천해보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처음 하는 농사도 힘들었지만 판매는 더 어려웠다. 수확한 팥을 팔러 안동시장에 나갔지만 허탕 치고 말았다. “팥은 수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탈곡한 뒤 물로 씻고 돌도 골라내야 합니다. 장에 나가기 전날 밤새 정선작업을 했는데 허탈하죠.” 양파는 모친의 소개로 중국집에 팔았다고 했다. 그는 “고령 농가와 귀농인으로서는 판로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애로”라며 “농협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구찬선임기자 chan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ns@sedaily.com
ch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