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션이자 ‘책방무사’의 주인장인 요조는 몸을 열심히 돌보는 것에 대해 ‘약간 조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고 어떤 상황에서든 악착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겉으로는 찬탄하면서도 내심 야유를 보냈다는 것이다. ‘몸 근육 불릴 시간에 책 한 자라도 더 보겠다는 마음.’ 그가 몸의 중요성을 혹독하게 깨닫기 전에 품었던 이 생각은 정확히 내 고집과 같았다. 그 질긴 고집이 하릴없이 허물어진 것은 지난해의 일이다. 가까운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아팠다.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웃다가도, 하루 종일 몸의 통증을 견디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내 삶도 부질없어지는 것 같았다. 제발 아프지 마라, 살아라. 살아서 다시 밥 먹고 떠들고 사소한 일로 울고 웃자.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일은 많고 나에게 쏟을 시간보다 타인에게 몰두하고픈 날은 훨씬 더 많아 몸 챙기는 일은 내게 언제나 후순위였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게 꽤 책임감 있고 이타적인 일이라 착각했지만 내 몸에 무심한 것만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일도 없음을 나는 이제야 알겠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삶’이라는 문장 앞에서 내 체력과 마음을 다 쓰고플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을 위해 건강해지고 싶었고 그들이 나를 위해 부디 건강해주기를 바랐다. 서로를 위해 우리의 몸은 더 안녕해야 한다.
/이연실 문학동네 편집팀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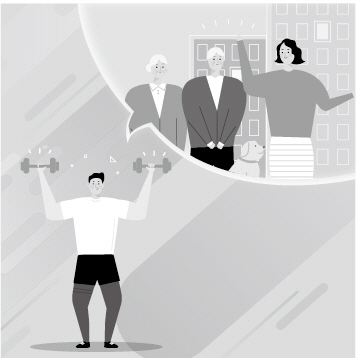

 yeonvic@sedaily.com
yeonv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