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은 꼭 우리 뜻대로 짓고 싶은데…”
적잖은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넘어서야 할 관문(?)은 그들의 부모들이다. “아버지·어머니, XXX 어떠신지요?” 그러면 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는 대개 그 이름에 ‘장관’을 붙여서 읽어본다. XXX 장관. 아이의 이름에 장관을 붙여서 소리 내 읽어보고(때론 아이를 XXX 장관이라고 불러보기도 한다.) 어색하지 않으면 합격, 어색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왜 장관 말고 ‘의원’은 안 붙여서 읽어 보냐. 의원은 별로냐”고 물으면 “장관이 돼야지, 의원이 돼서 뭐하려고”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
관리의 힘이 막강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는 아니다. 또 어떻게든 손자·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하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뒷받침할 근거가 아주 없는 주장도 아닐 수 있다. 법이 의전서열을 못 박고 있지 않으니 외교부가 발간하는 의전실무편람을 살펴보자. 편람에 따르면 장관의 의전서열은 19~33위로 73위의 국회의원보다 높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에서의 의전서열은 어떻게 될까. 장관의 이력, 의원의 선수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의원의 의전서열이 높다. 포럼 등 다양한 행사에서는 의원이 장관보다 앞서 축사를 하는 사례가 많다. 주최 측이 장관에게 앞 순서 축사를 요청해도 센스(?) 있는 장관이라면 의원에게 돋보이는 발언 기회(?)를 양보하고 뒷 순서 축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리에 앉을 때도 보통 장관은 의원에게 ‘상석’을 내어준다. 행사장에서 차를 타고 떠날 때는 대개 의원의 뒤를 따른다. 자칫 피감기관 수장이 의원에게 밉보였다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의원 말고 당 대표와 장관을 비교해보자. 지난 10월2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홍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TK) 후배잖아”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날 나이로 눌러보려고 하냐”고 맞받았다. “사회경력도 그렇고…”라고 홍 전 대표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장관도 못해봤으면서”라며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 이사장이 응수했다. 그러자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야당 대표를 맡았던 홍 전 대표는 “내가 (당) 대표로서 (장관들) 지휘를 해봤지”라고 받아쳤다.
경력 면에서는 내가 앞선다는 취지의 유 이사장 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참’이다. 하지만 편람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당 대표는 7위, 교섭단체 야당 대표는 8위다. 장관의 의전서열(19~33위)보다 확연히 높다. 실제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장관들을 불러 오찬을 하기도 했다. 당시 장관들은 여러 명씩 조를 짜서 이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도 당 대표의 위상이 더 높은 게 사실. 대표와 국무총리·부총리 등이 보통 참여하는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장관은 얼굴을 내밀기조차 쉽지 않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전 민주당 대표)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놓고 격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비록 전직 대표이기는 하지만 추 의원은 한 때 의전서열 7위였다.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그의 의전서열은 21위가 된다. 14단계나 하락하는 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당 대표를 지낸 의원이 국무총리라면 모를까,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에서 물러난 뒤 산업자원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당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문 대통령은 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격에 맞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려 하는 것일까. 추 의원은 또 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며 제안을 수락했을까. 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을 추 의원이 결국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검찰 배려’일 수 있다고 한다. 학자나 일반 의원, 비법조인이 아닌 당 대표·판사 출신의 그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검찰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한발 더 나가 그런 인사를 하려는 것을 볼 때 ‘검찰 개혁’ 역시 검찰을 달래가며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그와 완전 반대되는 분석도 제기된다. 추 의원과 같은 중량급 인사에게 법무부 장관직을 맡기려는 것은 검찰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그 분석이다. 어떤 분석이 더 정확한 분석이었는지를 가리는 첫 ‘시금석’은 추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뒤 실시할 검사장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다음 주 초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9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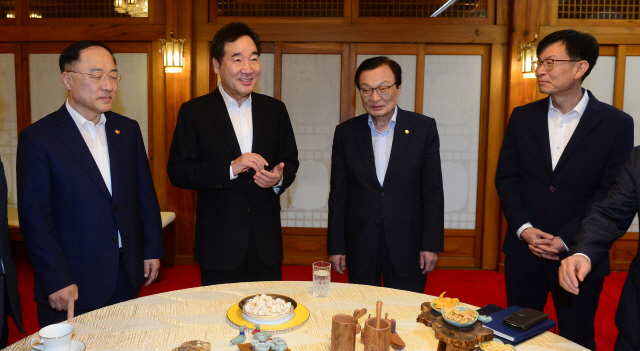


 jhlim@sedaily.com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