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사고만 보면 ‘국내 1위 철강사’라는 명예가 부끄럽다. 크레인 작동 사고,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포항제철소 코크스 원료보관시설 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았다. 사람이 죽지 않은 사고까지 일일이 열거하면 훨씬 더 길어진다. 올해 들어서도 포항제철소에서 쇳물운반기차 사고, 스테인리스 공장 화재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018년 기준 1만명당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율이 높은 사업장 11곳에 포항제철소(3.231명)와 광양제철소(0.862명)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피할 수 없는 불명예다.
그렇다고 포스코가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는 2018년 1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모두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보건종합대책을 마련해 3년간 1조1,0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009540)도 마찬가지다. 2월 울산조선소의 추락사망 사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한 달 동안 근로자 2명이 숨졌다. 5월에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질식사했다. 불과 5개월 만에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정부는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례적으로 조선사업 부문 대표를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은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안전경영을 해야 한다”며 향후 3년간 3,000억원을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는 필수다. 산업재해의 원인 자체가 설비 노후화, 위험의 외주화, 생산성 위주의 작업환경, 근로자들의 낮은 안전인식 등이라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든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 돈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돈만큼 중요한 것이 디테일한 안전수칙과 더불어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끈질긴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비용절감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CEO의 경영철학이 확고해야 안전수칙을 우선시하는 현장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CEO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부끄럽게도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제 그 오명을 벗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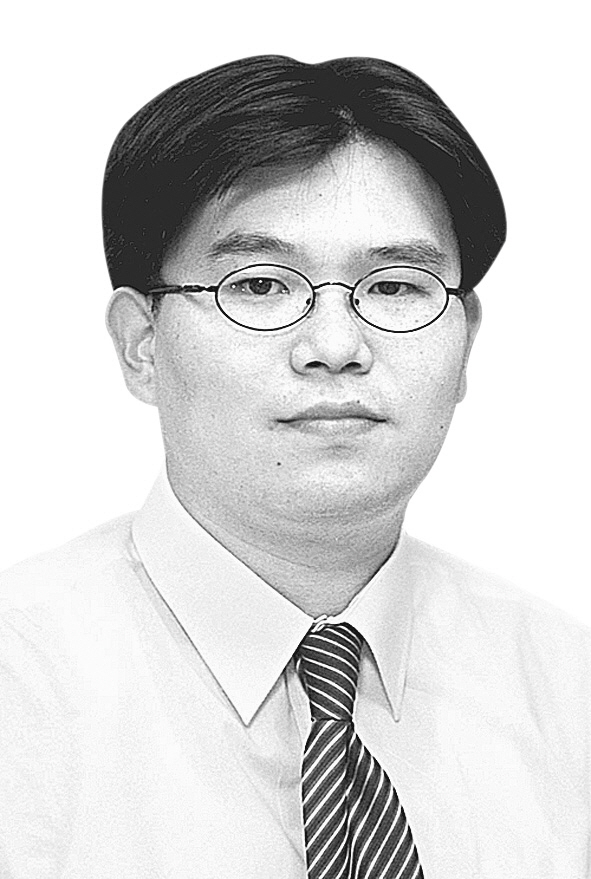

 kmh204@sedaily.com
kmh20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