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통보문을 보내왔지만 우리 군과 북측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지만 북한은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군 당국은 당초 6시간 동안 이씨를 억류 중에 피격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북한은 신원확인에 불응하고 도주할 상황이 조성돼 사격했다며 전혀 다른 경위를 말했다. 가뜩이나 군 당국의 안일함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180도 다른 해명을 내놓아 군 당국의 정보수집에 대한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다.
25일 북한이 보내온 조사 경위를 담은 통보문에서는 이씨가 불법 침입을 했다고 단정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군은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업지도선에 신발을 버려두고 간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단순히 선상에서 추락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미심쩍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이씨가 가족을 남겨두고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 된다. 통상적으로 월북자일 경우 북한은 이른바 ‘인민 영웅’으로 내세워 체제 선전에 활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해상에서 사살하는 이해 불가능한 조치를 내려 의문이 제기됐던 상황이다.
북한 통보문은 계속해서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열린 비공개 국방위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군이 이씨를 발견한 뒤 해상에서 놓쳐 2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민 의원은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가량 계속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군이 이씨를 다시 발견한 뒤 1시간 남짓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이 이씨를 6시간 동안 붙잡아둔 채 감시하다가 총격을 가했다고 했다.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도 북한은 ‘(해군)정장’의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 의원은 “북측 군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국회 국방위를 통해 군 당국의 입장을 대신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씨의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21일 밤 이씨가 실종된 후 22일 오후9시40분쯤 북한군이 이씨에게 총을 발사하고 오후10시11분쯤 북한군이 시신을 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명대로라면 이때 우리 정부가 확인한 불빛은 부유물을 태우는 것이 된다. 북한은 혈흔의 양으로 볼 때 이씨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이 직접 신속하게 사과통보문을 보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이 북한 측의 실수를 인정하고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은 9·19남북군사합의를 이어가기 희망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의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언급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측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 당시에 군 대변인을 통한 유감 표명에 그쳤다. 신속한 사과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오는 10월 방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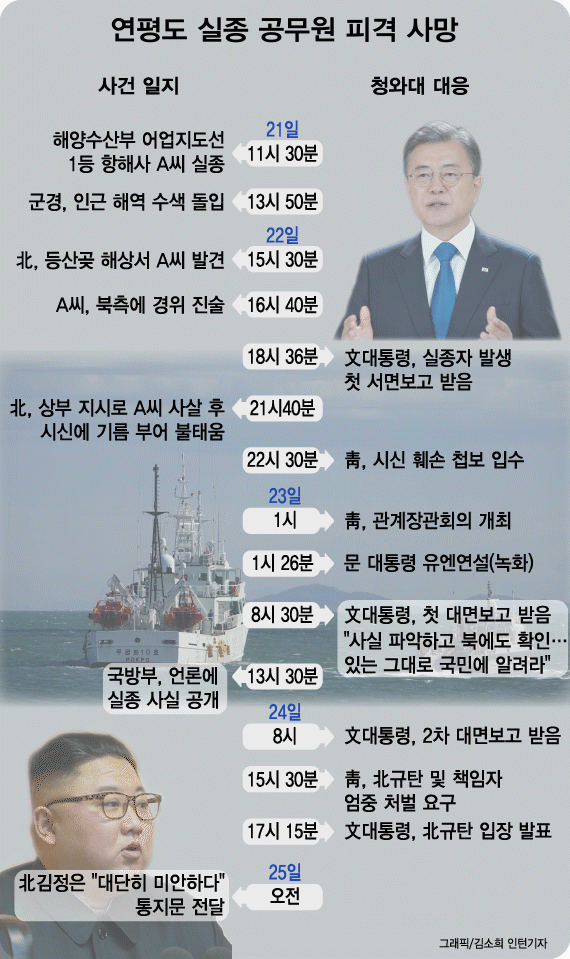

 joist1894@sedaily.com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