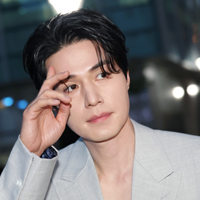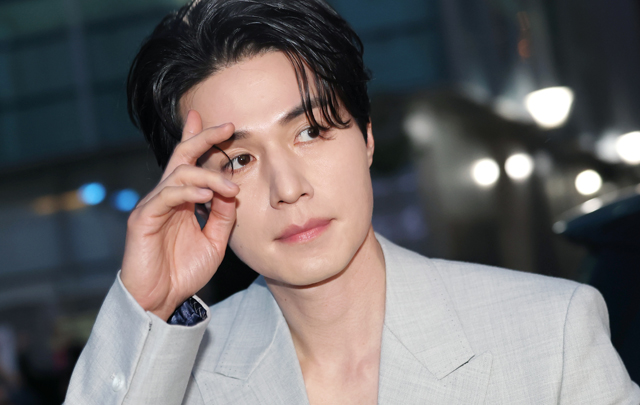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구체화하는 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16일 노사정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 노동조합이 없을 때 노사합의·협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뜻한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회의’를 구성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도록 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경우 노동법상 권한이 큰데도 법적 선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각종 ‘꼼수’가 만연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가 △경영상 해고 시 협의의 주체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 및 간주근로시간제의 합의 주체 △연장근로의 제한 합의 주체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거수로 선출하거나 명부를 돌려 근로자 절반의 서명을 받는 등의 방식이 많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대표를 모르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비밀·무기명으로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므로 합의한 문건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대표의 임기와 지위도 명확화한다. 임기는 3년이고 노사합의가 있으면 3년 한도에서 자율 결정한다.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대표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관련 합의 내용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교수는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만 7개 법률, 36개의 권한이 있다”며 “법 개정 형식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할지, 특별법 제정으로 할지는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