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들인 중국 주식·채권이 1,3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홍콩 증시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 상장된 증권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 시간) 자체 집계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9월까지 사들인 위안화 표시 주식, 또 채권 같은 고정소득증권이 총 7조5,000만위안(약 1,380조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7,600억위안, 약 140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FT는 투자자들이 미국 뉴욕이나 홍콩 등 글로벌 금융 허브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 직접 대거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또 “중국 금융 시장의 수익률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중국 대형주 300개를 묶어 거래되는 CSI300지수는 올 들어 현재까지 7% 가량 하락했다. 반면 위안화 표시 국채·회사채의 올해 수익률은 4%로 집계됐다. FT는 “이는 올해 달러화 표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 상황과 대비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올해 당국이 빅테크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중국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홍콩의 한 대형 자산운용사 소속 매니저는 FT에 “미국 같은 선진 증시보다는 상하이, 선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주가지수 제공사인 FTSE 러셀이 올해 3월 중국 국채의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승인한 것 역시 중국에 자금이 몰린 원인의 하나로 분석됐다.
중국 당국도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고 있다. FT는 “최근 10년 동안 중국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절반 가량 감소했지만 외국인 비중은 같은 기간 6%로 늘어났다”고 했다. 중국으로 ‘글로벌 머니’가 몰려들고 있지만 중국 금융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지금은 파산 위기에 처한 최대 부동산 개발사 헝다(에버그란데) 발(發) 위기는 중국 금융시장을 넘어 국제 시장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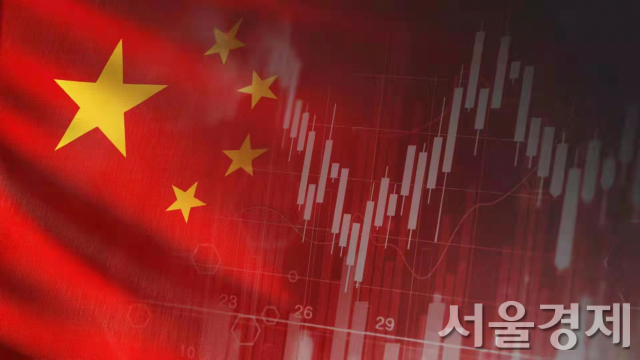
 mryesandno@sedaily.com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