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2월 26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 “미래의 정책 변경에 대해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면서 금리 인상 유보를 내비쳤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 등 ‘불투명성’이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며칠 뒤 발간된 연준의 ‘베이지북’에는 “미국 경제가 약간 내지는 보통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50%를 정점으로 지금의 0.25%까지 계속 미끄럼을 탔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한 해 8차례 발표하는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2주 전에 발표되는데 연준이 통화정책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1983년부터 공개 발간되고 있는 베이지북에는 연준 산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기업인,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산업 생산 활동, 소비 동향, 물가, 노동시장 상황 등이 두루 담겨 있다. 책 표지 색이 베이지여서 베이지북으로 불린다. 공개 발간 이전 13년 동안에는 빨간 색 표지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레드북’이 비공개로 발간됐다.
우리나라는 연준의 베이지북을 본떠 2005년부터 매달 녹색 표지의 ‘그린북’을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발간해왔다. 민간 소비, 설비투자, 수출입, 고용, 금융, 물가, 부동산 등 14개 분야의 조사 분석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다만 미국과 달리 통화정책 주체인 한국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을 발행한다.
미 연준이 1일 발간된 베이지북에서 “물가가 보통에서 강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더 속도를 붙일 태세다. 반면 한국 기재부는 7~10월 그린북에서 매번 언급했던 ‘불확실성’ 표현을 11월에는 쏙 뺐고 그 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안보다 3조 원 넘게 늘렸다. 경제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야 할 그린북이 정치 논리에 춤춘다면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된다. 그린북이 정치권의 돈 뿌리기 경쟁에 제동을 거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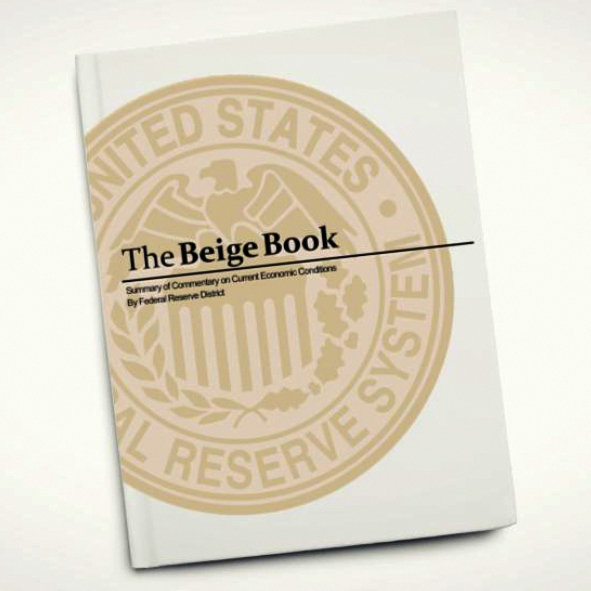
 hnsj@sedaily.com
hns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