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하게 마시고 버린 페트병, 편리하게 먹고 버린 배달 용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번에 2인분씩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1년간 버리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1342개, 총무게는 10.8㎏이다. 배달 음식만으로도 작은 플라스틱 산 하나가 생기는 셈이다. 음료수 병, 샴푸 통, 과일과 야채를 담아 파는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합치면 한국인 한 명당 연간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88㎏에 이른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에 따르면 이는 미국(130㎏)과 영국(99㎏)에 이어 세계 3위다. 일본(38㎏)과 중국(16㎏)보다 한참 많은 배출량이다.
그렇게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 산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 선별장이다. 최근 기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개인의 작은 편의를 위해 딱 한 번 쓰인 플라스틱이 모이면 얼마나 압도적인 양인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플라스틱 선별장은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 플라스틱을 소재별로 분류(선별)하는 곳이다. 선별장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도봉구 선별장은 시스템 솔루션 기업인 ACI의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봉구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이 도착하면 ‘파봉정량공급기’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담긴 비닐을 찢는다. 쏟아낸 쓰레기는 우선 사람 손에 걸러진다. 플라스틱 수거함에 옷, 가전제품 케이블, 닭 뼈 같은 쓰레기를 던져넣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1차로 걸러낸 쓰레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비중발리스틱’ 장비를 통과한다. 바람으로 종이나 비닐처럼 가벼운 쓰레기를 날려보내는 기기다.
다음 차례는 인공지능(AI) 로봇인 광학자동선별기.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투명·불투명 페트병 등 50여 가지의 소재와 색깔을 근적외선 가시광선으로 인식한다. 쏟아지는 쓰레기의 양에 비해 실제로 집어내는 속도는 다소 느려 보였지만 김현수 ACI 대표는 “AI 학습을 통해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선별을 마친 플라스틱들은 소재별로 압축돼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질 준비를 마친다. 재활용 공장에서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편한 칩으로 잘게 분쇄한다.
김 대표는 “여기는 공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선별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양은 현재 50톤 안팎이다. 그런데 실려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00톤 정도의 크기다. 찌그러뜨려 버리기만 해도 더 많은 플라스틱을 더 적은 차량으로 실어와서 처리할 수 있다. 그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밟아서 찌그러뜨리고 배달 용기처럼 큰 것들은 잘라서 배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페트병은 안쪽을 헹군 후 겉면의 라벨을 떼고 마개를 연 채로 찌그러뜨린 다음 다시 마개를 닫아 분리배출한다. 라벨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면 뗄 수 있는 만큼만 떼어내되 기업들이 애초에 뜯기 쉬운 라벨을 생산·부착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뚜껑처럼 작은 플라스틱은 따로 버리면 거의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닫아서 함께 버리는 것이 좋다. 재활용 과정에서 뚜껑만 따로 떠올라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잘 헹군 후 찌그러뜨리거나 잘라서 배출한다. 배달 용기를 밀봉하기 위해 부착된 비닐 필름이 재활용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역시 최대한 떼어내고 분리배출하면 된다. 배달 용기에 남은 양념·국물 자국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 재활용 전 기계 세척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더기만 없으면 재활용에 큰 지장이 없다.
수고롭게 분리배출하고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우리나라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54% 수준이다. 분리배출 과정이나 선별장에서 탈락되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54%가 전부 새 플라스틱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회수에 쓰인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9년 충남대 장용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실질적 재활용률을 조사한 결과 22.7% 남짓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비율이 90%, 100%가 되는 날이 올까. 최근 상황을 보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법 개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에 따라 기업들의 플라스틱 칩 수요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이나 음료수 병을 생산할 때 무조건 재생 원료를 30% 섞는 등 변해야만 기업 생존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의 관계자들이 선별장이나 재활용 공장을 돌며 원료 확보를 타진하느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덕분에 이미 소각로로 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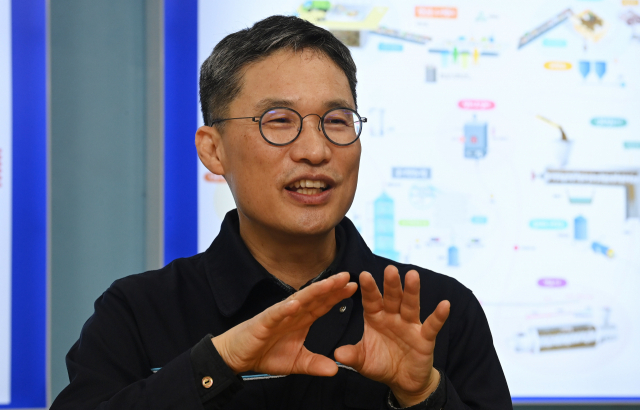

 ginger@sedaily.com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