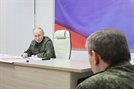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4년 7월 21일 토니 블레어가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됐다. 당시 노동당은 18년간 보수당에 패배해 무기력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불과 41세에 야당 총재가 된 블레어는 기존 좌파의 문법을 해체했다. “기업을 강조하는 대처가 옳았다”며 노동당 당헌 4조에서 산업의 국유화를 명시한 구절을 없앴다. 노동당은 특정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국민의 정당’이라고 선포하며 ‘신노동당’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경제발전 없이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무력하다”며 ‘제3의 길’로 수렴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덕분에 1997년 총선에서 압승했고 다우닝 10번가로 들어갔다. 블레어 집권 기간 영국은 경제 호황, 고용 확대, 공공투자 증가, 아동과 노인 빈곤 감소, 아일랜드 협상 타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는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했고 노동당은 후임 고든 브라운 시기를 합쳐 13년간 장기 집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반면에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의 힘은 커지면서 진보적 가치를 배신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바지를 입은 대처”라며 혹평했을 정도지만 영국 국민들은 강력한 지지로 화답했다.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가 영국을 재건했다면 블레어는 시대에 맞게 정책을 리모델링했던 셈이다.
요즘 여의도는 당권 경쟁이 한창이다. 1년 9개월 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당권을 장악해야 차기 대선을 기약할 수 있어서다. 당권을 거머쥔 후 불과 3년 만에 정권을 잡은 ‘블레어의 여정’은 당권 주자들에게는 탐나는 성취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이재명 의원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불과 넉 달 만에 당권 경쟁에 나선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게다가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패배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니 ‘대단한 정신 승리법’이라고 해야 할까.
이에 대항해 97그룹 의원들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지만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외려 지난 5년간 민주당의 실정(失政)에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던 행적이 복기되고 있다. ‘조국 사태’ 때는 자기 편 들기에 급급했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입을 닫았다. 전세 대란을 촉발시킨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한 모 의원은 법안 처리 한 달 전 월세를 올려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변화와 쇄신을 외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을 감았고 선택의 기로에서는 현실에 안주했다. ‘86그룹보다 10년 젊은 꼰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중징계를 기점으로 당권 경쟁에 돌입한 국민의힘도 나을 것은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취해 오만해진 것 아니냐는 지탄이 쏟아진다. 집안싸움은 멈출 기미가 없고 사적 채용 논란, 인사 검증 실패 등 거듭되는 헛발질을 보니 ‘도로 새누리당’으로 유턴하는 모양이다.
실력 있는 여당은 야당을 각성시키고 원칙과 상식을 갖춘 야당은 여당을 자극하며 비전을 찾아가는 게 정치다. 하지만 지금 여의도에는 시대를 읽는 안목도, 위기에 대처할 실력도, 난국을 극복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이 참패하자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은 ‘상상의 섬’에 고립돼 있다”고 일갈했다. 낡은 이념에 갇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노동당을 통렬히 비판한 것이다. 그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설득해 현실의 땅으로 이주해야 하지만 지금의 노동당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블레어 전 총리가 지목한 ‘상상의 섬’은 우리에게는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여의도인 듯싶다. ‘상상의 섬’에 갇혀 태풍이 몰려오는 데도 위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각성시킬 리더가 과연 있는가.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상상의 섬’에서 허우적대는 무능한 정치로는 한 줌의 희망조차 사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minj@sedaily.com
jmin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