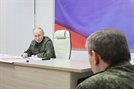중동 지역 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인 ‘1차 오일쇼크’(1973년 10월 16일)로부터 50년이 지났다. 이집트·시리아를 주축으로 한 아랍 연합군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 간 전쟁은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로 새 국면을 맞았고, 이스라엘 견제를 목적으로 한 유가 인상 및 감산, (이스라엘 동맹국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는 전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중동에서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은 다시 유가와 세계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날보다 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로 마감, 일주일 새 6%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도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전일 대비 5.7% 뛴 90.89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유가 향방은 전쟁 장기화 및 이란의 직접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 올 8월 기준 이란의 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314만 배럴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 주요 산유국의 감산에 의한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해 왔다. 골드만삭스는 서방의 제재 강화로 내년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325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은 9달러 넘게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이 맞대응으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유가 위기와 관련해 ‘공급 삭감’보다 ‘수송 리스크’를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란이 이번 분쟁에 전면 개입할 경우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해 ‘오일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세기 전 세계 경제가 유가 변수에 흔들렸다면 이번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유가 외에도 달러·금리도 위태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유가와 미국 달러는 반비례 흐름을 보여왔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겐 국제유가 등락을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이후로는 달러와 유가가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며 ‘경험칙’이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고유가·강달러의 ‘위험한 동행’에 고금리가 더해져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SMCB 닛코증권의 노지 마코토 전략가는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억눌렸던 소비의 반동과 정부 보조금에 따른 저축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계에 여력이 없다”며 “고유가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를 얼어붙게 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장은 ‘긴축 지속’ 방침을 시사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0MC)에서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기존 매파(긴축·고금리)적 입장을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채금리가 크게 뛴 데다 중동 리스크가 대두한 만큼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주요 산유국의 감산 및 수요 증가로 미국의 지난 12일 하루 원유 생산량은 1320만 배럴을 기록,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전쟁으로 인한 수요 확보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증대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들, 일명 ‘빅 오일(Big Oil)’이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가 폭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한 엑손모빌은 최근 600억 달러를 투입해 원유시추업체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인수했고, 쉐브론 등 경쟁사들도 관련 회사 합병에 나서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