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낭종은 암이 아닙니다. 당장은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수심이 가득한 채 동석호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마주한 환자들은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진다. 췌장은 질환이 생겨도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암이 생겨도 소화가 안되거나 명치 끝 쪽이 아파오는 정도라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이르러서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조기진단은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되다 보니 5년 생존율이 15% 남짓에 불과해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언론 보도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런 정보에 자주 노출됐던 환자들은 대부분 췌장낭종이 발견됐다는 검진 결과를 듣고 잔뜩 겁에 질려 병원을 찾는다. 심지어 당장은 암 관련 징후가 없으니 지켜보자고 해도 “불안하니 수술해달라”며 버티는 환자들도 있다. 동 교수가 의학용어인 낭종 대신 ‘물혹’이나 ‘물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건 환자와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을지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지방에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당일 오후 추가 검사 일정을 잡아주려 애쓴다. 아침 일찍 서둘러 먼 길을 온 환자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애 태워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양성이건 악성이건 종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손에 물집이 생겼다고 해서 손가락을 잘라내는 사람 봤느냐, 단순히 췌장에 물집이 생긴 상태라고 설명하면 십중팔구 수긍이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다양한 췌장낭종 중 암이 될 병변을 정확히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만으로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자기공명 담췌관조영술(MRCP)을 시행하거나 내시경초음파 유도하에 낭종액을 뽑아서 점성과 종양 수치를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명백히 전암성 병변으로 간주되는 점액성 낭성 종양이나 췌관내 유두 점액성 종양은 늘 악성 진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간혹 엉뚱한 곳에서 췌장암이 발병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췌장낭종 발견율이 급증하면서 낭종 크기, 고형 결절 등 보다 정확하게 악성화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 요소다.
동 교수는 “때로는 아는 게 병이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평생 모르고 살았을 병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40~50대가 되어 소화기 증상이 생겼을 때 한 번쯤 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췌장낭종은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기만 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췌장낭종이 발견됐더라도 불안해 하기 보다는 의사의 조언을 믿고 따라와 달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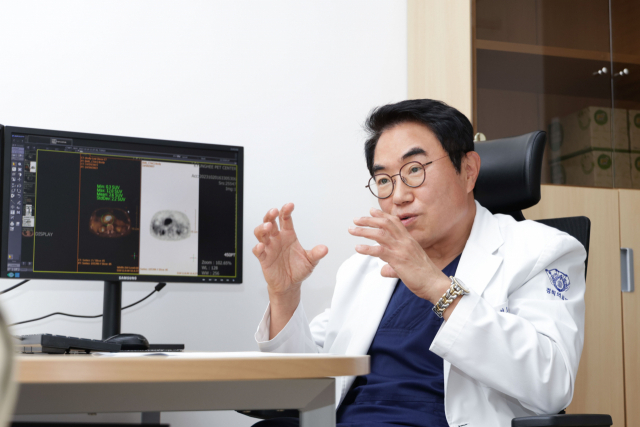
 realglasses@sedaily.com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