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푸른 빛깔의 머리를 한 82세의 이숙자가 작업실에서 기자를 맞이했다. ‘보리밭 작가’라는 거대한 별칭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작가는 쑥스러워했다. 작업실을 찾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기자는 의아했다.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실이 대체 왜 부끄럽단 말인가. 그런데 고개를 돌리니 자꾸만 작가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 작품 앞에서 머뭇거린다. ‘새로 작업 중인 작품인가’ 생각하며 말을 걸었다.
“이 작품이 요즘 새로 작업하고 있는…앗!”
기자는 탄성을 내뱉었다. 커다란 청맥 안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염색한 푸른 머리카락을 가진 이숙자였다. 여인의 몸은 앙상했다. 그리고 그 몸에는 80대 여성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갖고 있을 주름이 노골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표정은 우아하다. 통상 여성 누드는 지나치게 뽀얗고 탱탱한 피부를 강조한다. 좀 더 젠더를 강조하는 작가들은 여성의 몸에 딱딱한 근육을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작품 속 이숙자는 그런 표현 없이도 당당했다. 마치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나는 젊어봤는데… 너희는 늙어봤니?’라고 묻는 듯하다.
손수 기록한 작품의 여정…미술사 보물창고 될 이숙자의 작업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보리밭 작가’ 이숙자의 작업실. 도로에 위치한 아틀리에는 6층짜리 상가 건물의 5~6층에 위치해 있다. 작가는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기자에게 천천히 공간을 소개했다. 5층은 작가의 남편과 작가가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집은 경기도 분당에 있지만 언젠가부터 이곳에서 남편과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여기서 자고 일어나 위에 올라가 그림을 그리면 무척 편하다”고 속삭이듯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6층 역시 그저 상가의 사무실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총 세 칸 방의 문이 한 칸씩 열릴 때마다 기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곳은 바로 이숙자의 박물관이었다.
첫 번째 공간은 작가가 평생 작업한 수많은 작품이 쌓여 있는 ‘창고(작가의 표현)’다. 처음 작가가 됐을 때 그린 데생부터 그를 지금의 이숙자로 만들어준 수많은 보리밭들, 그리고 ‘이브’의 습작들이 상자에 포장돼 쌓여 있었다. 작가가 평생 제작한 580여 점의 작품 중 120여 점이 이곳에 있다. 작가의 보리밭 작품은 이미 30호짜리도 1억 원 이상 값을 치러야 구매할 수 있으니 이 창고가 바로 ‘보물창고’인 셈이다. 두 번째 방에는 도서관처럼 수많은 파일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파일을 한 권 꺼내보았다. 각각의 파일이 작품 한 점에 대한 기록이다. 언제 제작을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전시됐는지, 또 누구에게 팔려나갔는지 기록한 일종의 아카이브다. 지금은 직원을 한 명 두고 기록을 전산화하고 있지만 수십 년 전 제작된 작품의 역사는 작가가 쓴 이 파일이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다. 창고에서 도서관을 지나 세 번째 들어선 곳이 바로 앞서 언급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작업실이다. 작가는 “여기는 내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며 커튼으로 한 번 가리워진 작업실로 기자를 안내했다.
한 알 한 알 섬세하게 올려놓는 물감…보리밭 제작은 고독한 수행
이숙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 채색화의 거장이다. 채색화를 향한 그의 열정은 1967년 홍익대 동양학과를 졸업한 후 1969년 대학원에서 ‘채색화의 역사’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작가의 스승은 운보 김기창(1913~2001), 천경자(1924~2015), 박생광(1904~1985) 등 당대 색을 가장 잘 쓴다는 대가들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1960년대에 갑자기 불어온 ‘채색화=왜색’이라는 프레임은 평생 그를 옭아맸다. 이후 1960년대 주류 미술계는 수묵화만을 한국화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이 흐름이 단색화로 이어지면서 한국 채색화 작가들은 설 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던 작가는 35세의 어느 날, 시댁에 가던 길에 경기도 포천의 한 도로에서 보리밭을 만난다. 드넓게 펼쳐진 청록의 보리밭을 보고 그는 ‘평생 그려야 할 그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 튼실한 보리알이 계속 떠올라 정신없이 물감으로 보리알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보리밭은 작가를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는 1980년 중앙미술대전에서 ‘황맥 들판’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이후 보리밭 작가라는 별칭을 얻는다.
보리밭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작업이 수행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작가의 작품은 대개 가로세로 길이가 1m가 넘는 대작이다. 보리밭 작품은 실제로 보리를 한 알씩 볼펜으로 스케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모든 보리알에 한 알씩 물감을 떨어뜨려 실제 보리알처럼 도톰하게 지면 위로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다.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보리의 모양도 다 다르다. 작품 속 보리알이 1000알이라면 1000알을 모두 그렇게 제작한다. 당연히 작품 한 점을 완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작가는 “어떤 작품은 전시 준비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잊어버리고 10년 뒤에 발견한 일도 있다”며 “보리알을 그리다 보면 뻐꾹새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처음에는 한 알을 만드는 데 수십 차례의 수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감의 농도, 끈기, 무게를 가늠하는 데 능숙해져 두어 번만 똑 떨어뜨리면 알맹이가 만들어진다.
보리밭에 드러누운 나체 여성…그리고 82세 이숙자의 꿈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는 ‘이브의 보리밭’이다. 청색 보리밭에 나체의 여성이 누워 있는 작품이다. 보리밭으로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 ‘보리밭 작가’라고 불리게 됐지만 작가 스스로는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았다. 또다시 변화가 필요했다. 보리밭에 소를 그리기도 했고, 커다란 얼룩소를 소재로 한 작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을 그려도 다시 보리밭으로 돌아왔다. 결국 그는 보리밭 위에 사람을 그리는 것으로 갈증을 해소했고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1989년의 ‘이브의 보리밭’이다.
왜 보리밭에 하필이면 누드가 놓여야 하는 것일까. 작품 속 나체 여성의 표정은 하나같이 당당하다. 배고픔의 상징인 보리밭에 누워 있는 여성, 이브는 작가가 살아오며 끊임없이 이겨내야 했던 가부장적 인습에 대한 저항이며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이 ‘이브의 보리밭’ 후속작인 셈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작품 제작 과정은 여전히 대단하다. 작가는 “스스로 거울을 앞에 세워두고 나의 몸을 보면서 캔버스에 직접 스케치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렇게 커튼까지 치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작업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작가는 아직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사진은 전체 도상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때 작가의 뮤즈였던 ‘이브’와 달라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는 “그려 놓은 주름이지만 자연이 만들어 놓은 선은 아침과 밤,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며 “그저 ‘이숙자, 좋은 그림 그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절실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마음이 들어 평안해진다”고 말했다. 다음 전시 계획을 묻자 작가는 또 새로운 꿈을 펼쳤다. 그는 “전시가 열리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보리밭 작품을 꼭 내놔야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인물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해 보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물화를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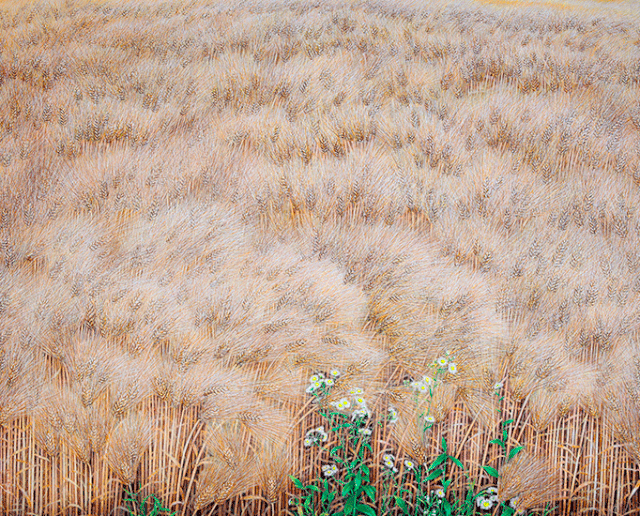



 wise@sedaily.com
wis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