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을 책임져 주던 전공의가 없으니 입원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외래진료를 보던 전문의가 뛰어 올라갑니다. 응급콜이 오면 외래를 잠시 중단하고 응급센터로 달려가야 하죠. 당직으로 밤샌 다음날 외래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만난 이현석(65) 서울의료원장(흉부외과 전문의)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의사 3분의 1이 줄어든 것, 그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의료원의 전신은 1911년 국내 최초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설립된 공공병원인 순화병원이다. 시립중부병원, 시립강남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을 거쳐 현재 명칭으로 불리기까지 100년 넘게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왔고 최근에는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서울 동북권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교수 사직 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세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료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서울시 비상경영체계의 일환으로 평일 야간진료를 연장했고, 전문의 당직 체계를 비상상황으로 전환하며 기존 7개에서 최대 18개 진료과로 늘렸다. 그렇다고 여느 공공병원처럼 전공의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서울의료원은 의사 정원 275명 중 98명(35.6%)이 전공의다. 그 중 93%가 미복귀해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는 극한으로 치솟았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지정 해제된 지 1년 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를 맞닥뜨린 대다수 공공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마지막 병원마저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일념에서 외래는 물론 중환자실, 응급센터 등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줄었지만 중증도는 평소보다 높아졌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막힌 고난이도의 환자들이 몰려온 탓이다.
이 원장은 “민간병원 같은 보상 체계가 없는 데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동료 의료진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며 “시민들이 필수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봐선 안된다는 사명감을 공유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물론 사명감만으로 현 상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병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에 나선 서울시의 도움도 주효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31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병원에 107억 원을 긴급 지원한 데도 병원장들과의 회동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지원금을 응급의학과 의사 수당이나 신규 채용 등으로 국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즉석에서 건의가 받아들여졌고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채용, 대체근무수당 등의 지원금을 병원장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고 말했다. 위기감이 턱 밑까지 찼을 무렵 자금수혈이 이뤄져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얘기다.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전공의 비중이 큰 시립병원 3곳에 26억 원이 투입되면서 의사 충원도 이뤄졌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가장 절박했던 입원전담 의사와 응급센터, 신경외과 전문의를 각각 1명씩 수혈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작년 7월에 취임해 10개월 차를 맞은 이 원장의 목표는 ‘직원들은 일할 맛 나고 시민들이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공공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와 끊임없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며 공공병원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원팀으로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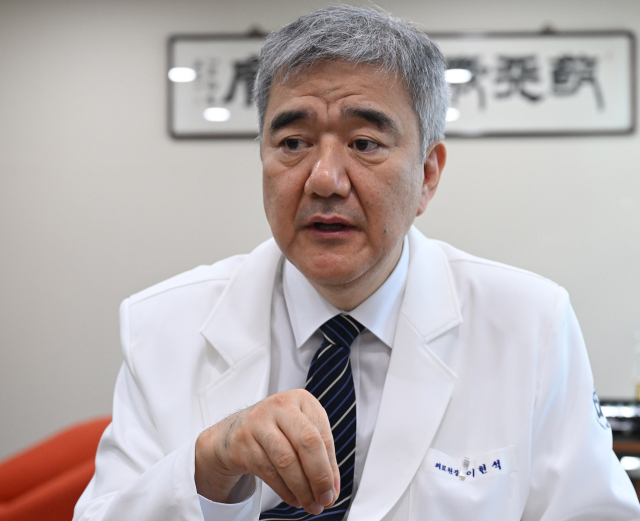
 realglasses@sedaily.com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