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아트마켓(PAMS)에서 선보인 ‘무용수 되기’ 공연 프로그램. 회색 티와 검정 하의를 입은 장애인 무용수와 다른 무용수와 함께 매끄러운 바닥을 무대로 삼았다. 두 사람은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로봇 팔을 움직이듯 어깨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였다. 장애인 무용수가 쓰는 상체의 근육은 비장애인 무용수와 다를 바 없었고 그들의 조화는 자연스러웠다. 작품에 몰입한 장애인 무용가 이윽고 휠체어에서 내려와 두 팔과 두 발을 사용해 바닥에서 뒹굴며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기린처럼 조심스럽지만 민첩하게. 변호사이자 무용수인 김원영씨가 프로젝트이인과 협업해 만든 ‘무용수- 되기’라는 작품이었다.
유전성 골격 질환인 골형성부전증으로 인해 김원영은 어릴 때부터 타인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됐다.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짧고 얼굴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사실 스스로 인식했다기보다 어머니와 할머니 등 주변 어른들의 말들이 깊이 내면화된 결과다. 다른 아이들이 기어다니지 않는 나이에 이르자 ‘기어다니지 말라’ ‘(가슴이) 불거지지 않게 해라’는 요구들을 들었다. 어른들이 꼽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이 필요해지고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다. 김원영은 휠체어를 타면서도 이왕이면 키를 커 보이게 하고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 통이 큰 청바지를 사서 모양을 만든 채로 빨고 말렸다. ‘정상인’의 몸과 비슷하게 보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그에게 ‘춤’이라는 것은 자격의 문제였다.
‘내가 춤에 대해 쓸 수 있을까. 아니 춤을 출 수 있을까.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에 대해 말하면서도 정작 장애가 있는 몸을 열등하고 추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했던 내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사계절 펴냄)’ 이후 6년 만의 새 저서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문학동네 펴냄)'으로 찾아온 김원영은 장애인도 춤을 출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힘든 과정을 담았다. 그는 2021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무용원 대학원 과정에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한예종은 다음 해 김예지 국회의원이 한예종의 무용원, 연극원 등 소속의 일부 학과에서 장애가 있는 지원자들을 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을 냈다. 전공 특성상 고도의 신체능력과 긴밀한 협업능력이 필수적인데다 신체적·지적 장애학생에게 일반 학생과 같은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거나 소수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 개설이 어렵다는 것.
김원영의 도전들은 장애가 있는 무용수는 고도의 신체능력과 긴밀한 협업능력이 있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을 돌파하는 과정이 됐다. 그는 춤을 추면서 자신을 포함한 장애가 있는 이들이 왜 타인과 눈을 마주칠 때 노려보게 되는지도 알게 됐다. 위에서 내려다보듯 보는 ‘응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기제였다는 것. 잔뜩 긴장돼 있던 가슴과 어깨에 힘을 푸는 법도 이해하게 됐다. 무엇보다 몸의 차이를 자격의 관점이 아니라 다름으로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분명한 색깔을 갖고 존재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의 글이 탁월함을 보이는 부분은 이 돌파 과정을 개인의 경험에 국한하는게 아니라 역사적인 고찰을 담아내 ‘춤의 자격’에 대한 탐구를 폭넓게 녹여낸 점이다. 그는 영화 ‘위대한 쇼맨’으로 유명해진 공연 기획자 피니어스 바넘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한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모아 공연을 선보인 ‘프릭쇼’가 정상인의 범주에서 벗어나 배제된 이들에게 직업은 물론 대중에게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점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제국의 시선을 내면화해야 했던 식민지의 무용수 최승희부터 권위에 대항했던 이사도라 덩컨까지 춤에 새겨진 억압과 돌파의 역사는 수세기를 걸쳐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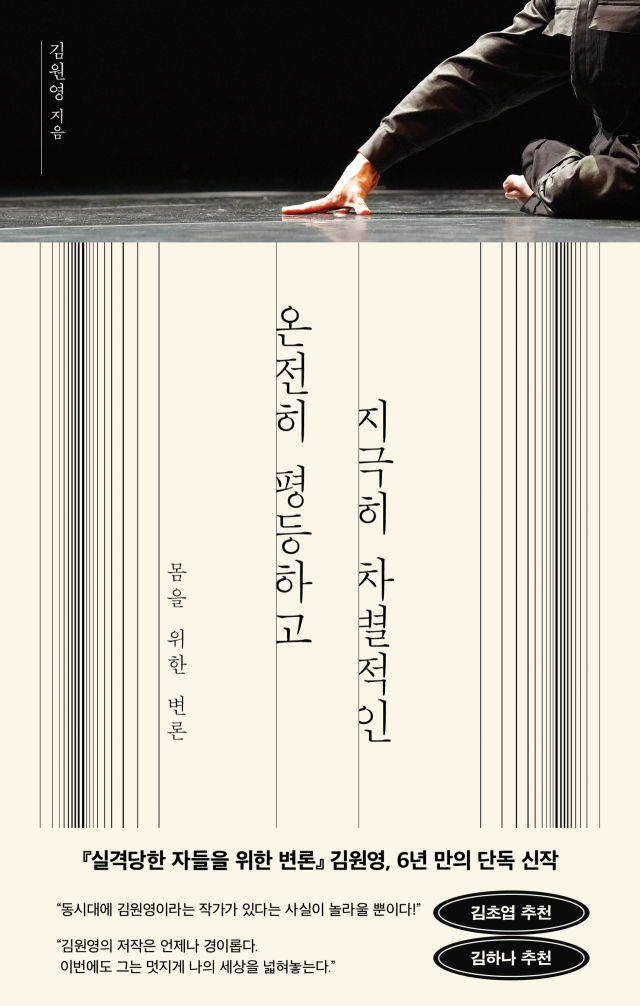
 madein@sedaily.com
made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