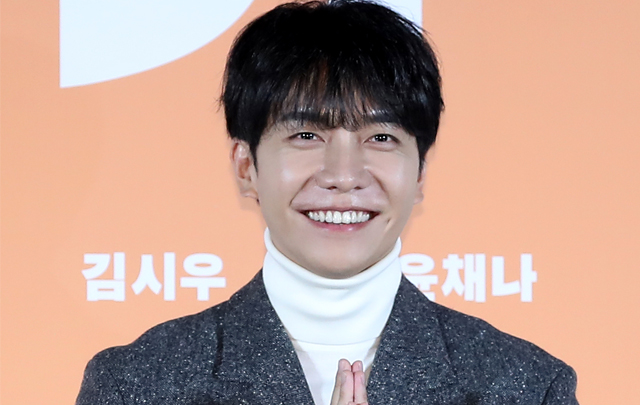잠이 안 오고 심장박동은 빨라지는 게 싫지만 커피는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대안 중 하나는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제품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보급되면서 생산량이 5년 사이 7.5배나 늘었지만 그 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디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만2358톤이다. 5년 전인 2019년의 1637톤에 비해 7.5배나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커피 생산량에서 디카페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0.2%에서 1.3%로 늘었다.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도 나란히 증가세다. 2019년 671톤에서 지난해 1410톤으로 2.1배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733톤이 수입됐다.
문제는 디카페인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카페인의 99%를, 미 농무부는 97%를 각각 제거해야 디카페인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크게 낮다. 게다가 커피 브랜드마다 디카페인 커피에 든 카페인 함량도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마트 등에서 팔리는 제품은 물론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들었을 때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디카페인으로 표시된 커피는 이 기준보다 카페인 함량이 낮아서 얼마나 들어있는지 소비자로서는 확인이 어렵다. 박 의원은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디카페인 커피 내 카페인 비중을 고지해 소지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디카페인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