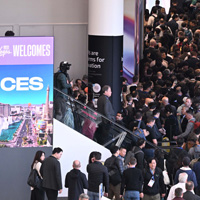2014년 전 세계는 ‘피케티 현상’으로 들썩였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21세기 자본’에서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을 때 부유층은 자산을 빠르게 증식해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부의 집중은 결국 ‘세습 자본주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다.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경고등이 울렸던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회과학 저서로서는 드물게 국내에서만 10만 권 가깝게 팔렸다.
지난 10년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치솟았다. 팬데믹을 계기로 금융 자산·부동산을 보유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글로벌 은행인 UBS가 지난해 조사한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백만장자의 수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많은 나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53.3%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상위 1%는 전체 부의 22.3%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렸던 피케티는 불평등 문제의 해답을 부유세에서 찾았다.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신간 ‘부의 제한선(세종 펴냄)’을 통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 일종의 ‘천장’에 해당하는 상한이 있어야 한다는 ‘부의 제한주의(Limitarianism)’ 개념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부유선(추가적인 돈이 삶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여주지 못하는 지점), 윤리적 제한선(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의 규모)을 내놓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의 규모인 ‘정치적 제한선’ 개념을 제시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 제한선의 부는 어느 정도일까. 그는 달러를 기준으로 ‘1000만 달러(약 138억원)’를 내세운다. 이 이상의 부는 삶의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못하지만 전체의 부의 배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에는 반론의 여지가 많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봤다.
그는 1970년대 이후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봤다. 당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감세를 단행해 70%에 달했던 최고소득세를 28%까지 낮췄다. 이 시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강경한 반노조 정책으로 단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비중을 크게 줄였다.
그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 해답으로 우리 사회를 50년 이상 지배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을 내세웠다. 인간의 이기심을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로 삼는 신자유주의의 속성상 불평등을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이미 고착화된 계급 간의 분리를 줄이기 위해 교육, 주거 지역 등에서 섞일 수 없는 서로 다른 계층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인구가 의무적으로 1년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안 등도 제시했다.
경제 권력에 균형을 잡기 위해 조세 재정 당국의 역량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일부에게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가 ‘불평등 대신 빈곤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반대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부분은 흥미롭다. 부자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한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한 나라 내의 불평등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반구 국가들과 남반구 국가들 간의 불평등, 나아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다. 그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서로에게 상호 이득이 됐다는 ‘윈윈 내러티브’를 내세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재산이 5000만 달러(약 691억원) 이상인 ‘울트라 부자’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26만4300명 가량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14만1140명)가 미국에 살고, 이어 중국(12.3%), 독일(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산’과 ‘경제력’은 사람과 국가의 잠재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불평등한 현재가 미래도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미국과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게임의 판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절박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dein@sedaily.com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