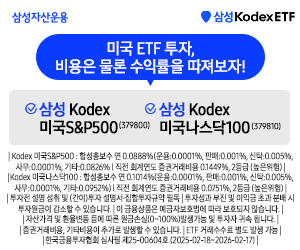‘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의 사정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겉보기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순항’하고 있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사건을 두고 각 사정 기관이 세 갈래 수사를 펼치면서 수사 권한 논쟁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실제 수사가 가능한 지’는 논란거리다. 경찰이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곳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물론 수사 경험이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 등이 수사 범위일 뿐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수사권에 대한 세 곳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신병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는 경찰이 보유하는 기현상마저 생길 정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수사 권한 논란은 향후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수사 위법성을 주장할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이는 자칫 검·경·공수처가 경쟁 수사로 쌓고 있는 공든 탑마저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사정 기관들끼리의 불필요한 경쟁이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혀 처벌에 이르게 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야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특별검사 도입이 향후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도입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민적 관심은 내란죄 수사를 향하고 있다. 검·경·공수처는 국민적 열망에 정치적 계산이나 직무 이기주의를 떠나 정직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이자 국민 자유·권리·인권 보호 등을 주된 직무(경찰직무집행법)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 1번지’ 서초동에서 뼈대가 굵은 변호사가 현 상황 자체를 ‘수사 방해’라 지목하고 “실질적 합동 수사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게 ‘경쟁적 수사인지, 공조인지’ 선택은 자유다. 하지만 판단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