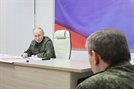글 김방희
서울은 유행에 민감한 도시다. 대중가요와 패션을 포함해 최첨단 트렌드가 세계 주요 도시와 동시에 상륙하는 곳이다. 사회적 의제(agend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의 수입품은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다. 지난 15일 한국의 월가에 해당되는 여의도에서도 점령 시위가 시작됐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탐욕스러운 금융산업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최신 유행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금융 산업이 처한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가 지배적 사고방식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금융 산업은 세계화와 정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더 많이 누려 왔다. 그 결과 금융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타락했다는 것이 미국 시위대의 불만이다. 반면 한국의 금융 산업은 오랫동안 정부의 보호와 규제에 의존해왔다. 물론 1990년대 이래 세계화와 규제 완화라는 추세에 발 맞춰오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뿌리 깊은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금융 산업은 이상 비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세계 수준에 비해 작은 규모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여전히 변치 않는 관치 금융 관행은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 통제 불능 상태가 돼 버린 미 금융 산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일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얘기하듯, 여의도 시위는 월가의 ‘짝퉁 퍼포먼스’에 불과한 걸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월가 시위대의 구호는 여의도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금융이 타락했다는 지적에서 서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은 다수의 이익을 외면하고 소수의 탐욕만을 위해 봉사해왔다. 금융 산업은 손실을 공공의 부채로 돌리는 대신 이익은 사유화해왔다. 이 점은 한국의 금융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금융 산업 종사자의 보수가 미국 못지않게 높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금융업 임금은 제조업 대비 1.6배에 달한다. 제조업과 금융업 간 임금 격차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크다. 일부 증권사 경영진의 보수와 성과급은 세계에서 가장 터무니없다는 월가보다 더높다. 고객의 돈을 굴리는 증권사 직원들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챙긴다. 하지만 손실을 초래했을 때 분담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성과급의 비대칭성도 존재한다. 금융의 타락이라는 면에서 월가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
대규모 구제금융이 사실상 처음인 월가와 달리, 한국 금융 산업은 위기 때마다 정부의 도움으로 연명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는 167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는 정부 보증으로 외환 유동성 위기를 넘겼다. 2004년 신용카드 사태 당시에는 신용카드사와 모회사 간 편법 합병을 통해 실마리를 풀었다. 현재 진행형인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에는 최종적으로 얼마의 구제금융이 필요한지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 산업이 국민에 지운 부담은 단순히 세금만이 아니다. 신용카드 사태 당시에는 40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 저축은행 사태도 수많은 예금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겼다. 금융회사들은 아예 위기 때마다 진원지로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다.
그런데도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섣부른 잔치판을 벌여 왔다. 최근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너무 높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최근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금융 불안기에 최대의 이익을 낸 것은, 사실상 정부가 만들고 소비자들이 견딘 큰 폭의 예대마진 덕이었다.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은행들은 전체 이익의 90% 가까이를 벌어들였다. 나머지마저 직접 은행을 찾는 서민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물림으로써 충족시켰다. 이 역시 월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영업 관행이다.
여의도 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은 시위의 주축세력들이 월가와 다른 점도 지적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청년들이 서울에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 젊은 층은 타락한 금융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닫은 저축은행에 소액이라도 맡길 여유가 없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형편조차 안됐다. 지금 같아선 금융 산업이 그 점이나마 위안 삼아야 할지 모른다
김방희(생활경제연구소.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진행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