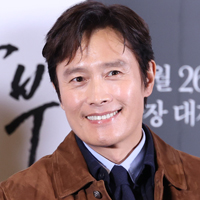이는 물리학 실험실을 넘어 모든 곳에서 진실로 작용한다. 데이터와 소셜네트워크에 파묻혀 살면서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 물질계다. 물자를 생산하고 이리저리 공급하는 것이 인류가 누리고 있는 번영의 근간이다.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월마트가 2위를 차지했고, 1위를 포함해 10위 내의 기업 중 7개사가 에너지 관련 기업인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물질의 생산과 공급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항공기 제작에도, 강줄기를 바꾸는 데도, 도시를 밝히는 데도 에너지가 든다. 컴퓨터 작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누리꾼들이 구글로 검색을 한 번할 때마다 하면 60W 전구를 17초 켤 수 있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런 만큼 에너지 생산량 상위 2개국, 즉 미국과 중국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힘이 센 국가들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사실 미국은 2006년 중국에 추월 당하기 이전까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합친 에너지 생산량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다.
잠깐 샛길로 빠지자면 이런 이유로 혹자는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지위 감소를 예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미국의 석유생산량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3위임에도 다른 나라에서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제는 아직 석탄 기반이며 경제성장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중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내수 경제에 더해 수출을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한다.
아무튼 물자의 이동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어떤 이득이 생길까.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처럼 그동안 경제 성장은 물자의 이동속도 향상과 이음동의어로 인식됐으며 국가 건전성 지표로도 오랫동안 활용됐다. 하지만 물자를 빨리 이동시키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지구의 기후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세상의 참모습을 보려면 또 다른 공식인 'W=Fd'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일(W)은 힘과 이동거리에 비례한다는 뜻으로 많은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키려는 노력에 더해 꼭 필요한 물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한다는 얘기다.
STORY BY Luke Mitchell
ILLUSTRATION BY Ryan Snook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