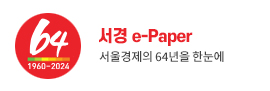단색화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단색 화가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그 중 박서보 등과 함께 대표적인 단색화 작가로 손꼽히는 정상화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글·사진 서진수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 겸 미술시장연구소소장
“벽지 같은 그림을 누가 돈 주고 사나요?” 정상화 작가가 1983년 갤러리 현대(구 현대화랑)에서 처음 전시를 열었을 때, 관람객들이 보인 반응을 작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30년 세월 동안 벽지도 많은 발전을 이룬 걸까. 벽지 같은 미술 작품값도 억대에 이르렀다. 단색화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여기저기서 단색화 작가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원로작가들의 손맛 좋던 전성기 때 작품, 실험정신과 열정을 가장 많이 쏟던 시기의 작품을 구하려고 때 아닌 경쟁이 일고 있다.
세월 따라 세상이 변한다고 했던가. 정상화, 박서보, 윤형근, 정창섭, 하종현 등 단색 화가들의 작품이 요즈음 화랑가와 경매시장에서 단연 인기다. 단색화는 한때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작가, 극사실 작가, 장식하기도 좋고 손맛도 살아 있는 작가, 해외 작가들의 작품에 밀려 대접을 받지 못했다. 단조로운 작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한동안 잊었던 질문이 다시 생각난다. 미술사와 미술시장은 같이 가는 것일까? 아니면 미술사에 기록되는 작가가 따로 있고 미술시장에서 인기 있는 작가가 따로 있는 것일까?
단색화는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나 중반 이후 널리 퍼진 우리 화단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화풍이다. 단색을 기본으로 하는 이들 작품은 일반적으로 미니멀 아트로 대변되는 서구 모더니즘 사조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된다. 그렇지만 단색화는 미니멀 아트와는 다른 미학과 재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고유 화풍이다.
한동안 저평가 됐던 단색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 단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2012년 3월 ‘한국의 단색화 Dansaekhwa: Korean Monochrome Painting’전을 열면서 마련되었다.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김환기, 곽인식,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윤형근, 하종현 등 17명의 전기 단색화 작가와 이강소, 문범, 이인현, 김춘수, 노상균 등 14명의 후기 단색화 작가의 대형작품 150여 점을 소개한 대규모 전시였다.
미술관 전시의 특징과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 전시였다. 주제를 가진 대규모 기획전시와 함께 학술대회와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담론이 계속되고 국내외에서 단색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전에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박서보, 정창섭, 하종현 등의 초대전을 열었지만 회고전 형식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이 전시는 단색화라는 고유명사를 창출하고 관련된 작가를 모두 모아 집중적인 조명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전시였다.
이후 단색화 작가와 작품은 각종 전시와 미술시장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2014년 6월에는 중국 상하이의 조소유화원에서 단색화 그룹전인 ‘텅 빈 충만과 한국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이 열렸고, 홍콩 M+미술관의 ‘M+ Matters: 전후 일본, 한국, 대만의 추상미술’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단색화가 소개되며 현지인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국제갤러리, 표갤러리, 박여숙화랑 등에서 박서보, 정창섭, 하종현, 윤형근 등의 전시가 있었다. 또 경매 거래와 화랑 전시에서도 단색화 작가를 재조명하는 노력이 있었다.
갤러리 현대에선 단색화가 정상화의 대규모 전시를 7월 한 달간 열었다. 1970년대 초기 작품부터 최근에 마친 작업까지 40년간 뜯어내고 메운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였다.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작가는 10년간 열정을 바친 미술 교사직을 사직하고 1967년 자신의 꿈이 거기에 있다는 일념 하에 프랑스 파리로 떠났다. 파리에서는 한국대사관이 소개해준 집 리모델링 회사에서 일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에칭 판화 3점 판매를 시작으로 5년 후에는 독일 아헨 전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객지 생활 30년인 그의 이력란에는 1967년부터 1992년까지의 두 번에 걸친 프랑스행과 한 번의 일본행을 도불(渡佛)수업 기간, 도일(渡日)수업 기간이라고 적어 놓았다. 작업을 수업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작가의 면모가 나타난다.
박명자 갤러리 현대 대표와도 파리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종이로 가린 남루한 작업실을 찾은 박 대표는 작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었다. 이때 맺은 신뢰 관계로 정상화 작가는 1983년 첫 전시 이래 30년간 갤러리 현대와 손잡고 일하고 있다. 전속작가제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의 현실에서 원로작가들이 여러 화랑에서 전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 작가의 일관성은 화랑의 선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시종일관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단색화 화가라는 일관된 작업방식까지 합치면 정상화의 삶은 ‘일관성’이란 단어로 통한다. 회화의 종말이 거론되던 시기에 그는 오히려 “인간이 벽을 가지고 사는 한 회화는 살아있다”며 과감하게 회화의 실험성을 택했다. 그는 부정과 긍정의 반복, 가식 없이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정상화는 흰색, 청색, 청회색, 검정색, 적색 등 다양한 단색을 사용하여 크고 작은 네모를 40년이나 채웠다 비웠다 했다.
논의 흙을 쟁기로 고랑마다 갈아엎고 물을 채우고 또 계속 써래질을 하며 씨 뿌릴 모판을 만드는 과정과 같은 고통의 작업을 계속 했다. 어떤 때는 한 가지를 끝없이 반복하는 자신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 금세 심오한 힘이 솟구쳤다고 한다. “예술은 참 묘하다. 내가 해온 작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다”며 “작품을 이해해주는 관객이 있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보는 사람이 비슷비슷하다고 느끼는 작품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 끝없이 파괴, 파산, 부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나름대로 쾌감도 느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줄어들 게 없는데 자꾸 줄어드는 수축감을 느낄 때가 있고, 종이 두 장을 들고 작업하다가 윗장을 싹 빼면 남은 종이에 뭔가가 보일 때도 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바꿔가며 실험을 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작업을 했다.
근현대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인 서울옥션과 K옥션에서 정상화의 작품은 총 125점 가운데 101점이 낙찰되었다. 81%의 낙찰률을 보인 인기작가다. 낙찰총액은 22억 8,200만 원. 최고가는 9,500만 원으로 K옥션 2007년 9월 경매에서 낙찰된 1981년 작 120호가 그 작품이다. 정상화는 박서보 등과 함께 단색화 작가 중 경매시장에서 인기작가로 통하고, 미술계 종사자들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작가로 꼽힌다.
단색화 재조명의 시대에 메우기와 뜯어내기, 또는 끊임없이 캔버스를 채우며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을 반복하는 단색화 작가들은 대부분 80대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물아합일의 정신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부는 단색화에 대한 열풍은 분명 우리 것에 대한 재인식이고, 이러한 재인식은 우리 미술의 융성을 위한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서진수 교수는 …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2002년부터 미술시장연구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미술시장연구연맹(AAMRU)의 공동창설자이자 한국 대표로 아시아 미술시장의 공동발전과 체계적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경제의 이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