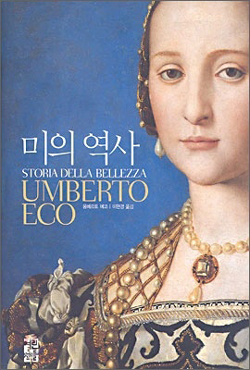|
움베르토 에코와 같은 천부적인 글쟁이가 한 세기에 몇이나 나올 수 있을까.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전 세계에 엄청난 ‘에코 폐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 작가는 도무지 소진되지 않는 화수분같은 필력을 자랑한다. 에코는 이번에 전 세계 10개국에 동시 출간된 ‘미의 역사’에서도 자신의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미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지지고 볶고 해서 더 이상 쓸만한 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주제가 도마에 올랐다. 에코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절 주절 늘어 놓지 않는다. 또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미의 속성을 뽑아 내려는 과욕을 부리지도 않는다. ‘밀로의 ‘비너스’에서부터 앤디 워홀의 ‘마를린 먼로’까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부터 카프카의 ‘유형지’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바르트의 ‘현대의 신화들’에까지 에코는 각 시대 속에서 인류가 예술과 미라고 여겼던 대상물에 대한 웅장한 역사를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 뽑아낸 사진처럼 쭉 펼쳐 놓는다. 미에 대한 에코의 개인적 취향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애초에 이 책의 주제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음을 안다면 그다지 서운할 것도 없다. 그 이유는 서문에서 크세노파네스의 글을 인용해 충분히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황소와 말과 사자 등이 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인간처럼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말은 말과 비슷하게, 황소는 황소와 비슷하게 신을 그려낼 것이다. 그리고 신들에게도 자신들과 똑 같은 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저자는 미의 통일성이 아니라 차이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