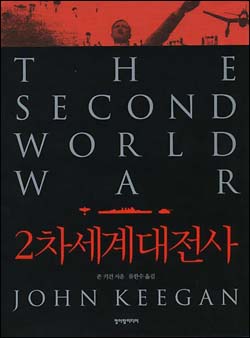|
사망자 5,000만명. 2차세계대전의 결과다. 인간은 왜 그토록 서로를 증오했을까. 분석은 널려 있다. 관련서적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특징은 방대하다는 점. 처칠 전 영국수상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2차대전회고록'을 비롯해 20~30권짜리 대작이 수두룩하다. 청어람 미디어에서 새로 펴낸 번역서 '2차세계대전사'는 이런 점에서 특이하다. 6년간 일어난 사건을 단 한 권으로 압축했지만 내용은 오히려 깊다. 저자가 존 키건이기 때문이리라. 영국 육군사관학교에서 26년간 전쟁사를 강의하고 20여권의 저술을 통해 '전쟁사를 대중화시킨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국내에도 '정보와 전쟁', '승자의 리더십 패자의 리더십' 등 다섯권의 번역서로 알려져 있다. 책에는 전쟁의 지역과 시기, 공중전ㆍ해전ㆍ전차전ㆍ시가전ㆍ상륙전 등 양상, 지도자들의 성향과 고뇌가 911쪽의 분량에 촘촘히 박혀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 각국의 경제성장과 생산, 고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느 책에서 살펴볼 수 없는 자료로 가득하다. 가령 독일의 침공에 맞서 군수산업을 우랄산맥 동쪽으로 이동시킨 스탈린의 불가피한 선택은 '소련의 제 2차 산업혁명'을 낳았다. 미국의 성장과 독일ㆍ일본이 지닌 생산력의 한계가 결과를 갈랐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증빙된다. 키건은 또 다른 특징은 정치ㆍ외교ㆍ사회ㆍ문화ㆍ심리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조망한다는 점. 2차대전의 기원을 18세기 대혁명 당시 위기에 처한 프랑스가 내린 국민총동원령, 즉 국민개병제에서 찾는다. 국민개병제로 모집된 병사로 전쟁을 치룬 나폴레옹 이후 1차대전까지 100년간 평화기간중 각국은 기술을 개발하고 병사의 질을 높였고 결국은 양차대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종전 후 기술과 개인의 역량 발전은 이전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점에서 슬며시 겁이 난다.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날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