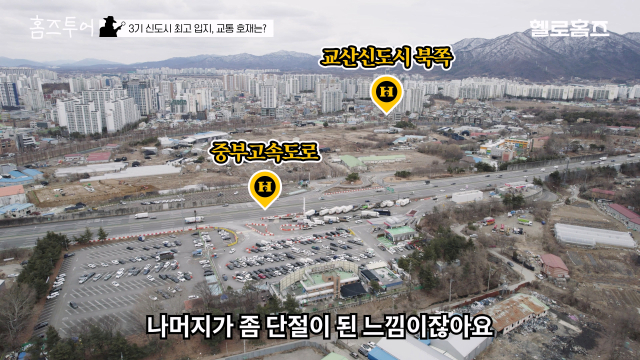|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로 최근 한국 경제에 ‘샌드위치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활발한 기술개발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고,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모델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제조업의 생산성 저하가 주된 이유다.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다. 생산성이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생산성이다. 부가가치생산성은 부가가치를 종업원 수로 나눈 것이다. 종업원 한 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클수록 부가가치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는 생산ㆍ판매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말한다. 기업의 부가가치액은 그 기업이 전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연료, 하청기업이 납품한 부품 등 다른 기업의 생산물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부분을 뺀 나머지가 된다. 예를 들어 제과업체가 농부에게서 100원어치의 쌀을 구입해 떡을 만들어 150원을 받고 분식가게에 판매했다. 이 경우 제과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원이다. 분식가게가 다시 이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200원에 판매했다면 떡과 떡볶이의 판매액 차이인 50원이 분식가게가 창출한 부가가치다. 이렇게 개별 경제활동 주체의 부가가치를 전국적으로 집계하면 소위 한 나라의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국내총생산(GDPㆍGross Domestic Product) 개념이 된다. 부가가치는 창출 측면에서 재료비ㆍ구입노무비 등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매출액에서 차감해 계산하거나 분배 측면에서 인건비ㆍ이자ㆍ이윤 및 세금 등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분배 측면에서 접근해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90년부터(1998년 집계 방법 수정) 매년 ‘경제통계시스템-기업경영분석’란에 부가가치ㆍ 노동장비율ㆍ자본생산성 등 생산성에 관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부가가치/매출액)×100%). 위의 예에서 제과업체의 부가가치율은 50%이고 분식가게의 부가가치율은 25%가 된다. 부가가치율이 높으면 제품 단위당 부가가치가 크므로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노동장비율은 종업원 한 명당 기계ㆍ설비 등 자본재의 집약도를 나타낸다. 흔히들 산업을 이 비율의 크기에 따라 자본집약적 또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한다. 노동장비율이 높으면 생력화(省力化)가 가능해져 생산성이 향상된다. 자본생산성은 총산출을 투입요소인 총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자본생산성이 높으면 기계ㆍ설비의 가동률이 높아 제품 단위당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부가가치율이다.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2006년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0.9%로 1990년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투자가 부진한 것에서 비롯된다. 국내 서비스업 역시 2004년 이후 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다. 2007년 국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1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서비스업은 주로 부가가치율이 낮은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의 비중이 크고 그나마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예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 노사관계를 안정화해 기업의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금융ㆍ광고 등 제조업 발전에 중간재 역할을 하는 서비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시너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