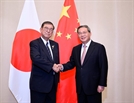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병철 회장, 구인회 회장 등 창업 1세대부터 중소기업과의 공존은 중요한 화두였지만 한편으로 중소기업계에서 부당 단가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내부적으로 제도화해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대기업들은 대부분 동반성장 및 협력업체 지원정책을 이미 갖췄다. 삼성의 경우 상생협력센터를 마련한 것은 물론 1ㆍ2ㆍ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중은행과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보증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거래관계 확대기회 부여 등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2011년과 지난해 대기업 빵집,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MRO) 문제가 불거지자 아이마켓코리아와 아티제 사업에서 손을 떼며 오너 차원의 동반성장 참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LG 역시 각종 협력사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물론 협력사들도 자체적인 동반성장 협약에 나서고 있다. LG 1차 협력회사는 지난해 2차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60일 이상 어음지급 퇴출 ▦현금결제 확대 ▦대금지급 기일 단축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정도경영을 위한 윤리규범 실천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동반성장이 언제든 보이지 않는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을 당시 양금승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을 잘하는 56개 기업을 선정해 조사했는데 여기서 보통이나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도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들이 경영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LED의 경우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중기적합업종이 됐지만 결국 외국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며 "동반성장을 이유로 산업 생태계를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