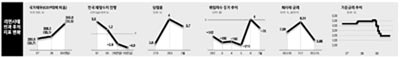정부 주도 강력 경기부양에… 올 국가채무 366조 이를듯<br>고령화등 충격요인 수두룩… 재정건전성 확보 서둘러야
 | | 리먼 파산 1년. 경제지표들에 속속 온기가 퍼지고 있지만 후유증은 경제현장 곳곳에 여전하다. 특히 경기의 가장 후행적인 지표인 고용은 실업자 100만명을 앞둘 만큼 치유하기 힘든 사회문제로 고착화하고 있다. 서울 고용지 원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금융위기 1년의 어두운 단면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서울경제 DB
|
|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1년. 한국 경제는 양날의 칼을 잡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금융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날 선 칼이 기다리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쓴 탓에 나라의 곳간은 점점 비어간 셈이다.
리먼 파산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관리 능력은 외환위기 학습효과를 거치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돋보였다.
지난해 4ㆍ4분기 -5.1%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ㆍ4분기 2.6%로 급반전하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한국경제를 수렁에서 건진 위기 대책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30년 만에 수정예산으로 10조원을 증액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28조원이 넘는 수퍼 추경을 짰다.
지난 1~2분기 재정집행 등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위기 전 2년간 평균인 0.6%포인트의 3~4배인 각각 1.5%포인트와 1.9%포인트에 달한다.
경기 침체기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은 정부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2007년 298조9,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308조3,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36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정부 주장대로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은 아직 양호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35.5%)는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7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정악화속도가 너무 빠른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올해 366조원에서 내년에는 400조원 2014년에는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재정은 외부충격의 흡수장치이며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한꺼번에 무너질 위험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이르면 2013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감세정책과 서민대책을 위한 정책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이 부딪히는 가운데 이러한 목표가 달성 될 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미래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진행, 4대연금의 재정악화, 통일비용 등 재정 충격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남북한이 독일식의 급진적 통일을 이룰 경우 남한 GDP의 12%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과감한 세입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한다면 재정부담은 후손에게 떠넘기는 빚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