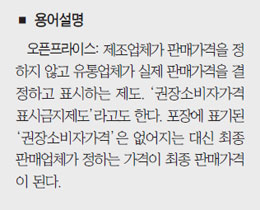|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공식품과 신사ㆍ숙녀ㆍ아동ㆍ운동복에서 의류 전 품목까지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어지는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앞두고 라면업체를 제외한 해당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올리면서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인상 러시, 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줄줄이 올리는 까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포장지에 쓰여있던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격에 민감한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식품 가격이 인상돼도 소비자들은 모른 채 넘어갈 공산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오픈프라이스가 소비자주권을 향상시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지적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색내기 정책 우려 = 권장소비자가격 폐지의 가장 큰 목적은 가격인하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는 당초 목적과 달리 실제 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한 후 마치 할인혜택이 큰 것처럼 판매하는 수법으로 악용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스크림 반값할인을 들 수 있다. 빙과업체들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최고 50%가까이 올리고 최종 판매할 때는 다시 할인 판매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 유통업체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99년 텔레비전,VTR등 가전제품과 화장품에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오픈프라이스가 처음 적용됐던 화장품만 봐도 그렇다. 당시 정부는 화장품 전문점의 반값할인 등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오픈프라이스를 시행했지만 화장품가격은 되레 크게 올랐다. 화장품 산업이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럭셔리 산업이라는 속성은 잊은 채 오픈프라이스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결국 화장품전문점이라는 유통 채널만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의류도 효과는 없을듯= 올 하반기부터 의류도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지지만 업계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판매가격’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 외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의류업은 식품과 달리 제조업체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패션업은 백화점, 마트, 가두점을 불문하고 점포를 임대해 매장을 여는 위탁판매업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한 업체들은 임대 수수료만 지불할 뿐 최종 가격결정권은 제조업체가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장소비자가격 폐지로 인한 가격 인하 경쟁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게다가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 의류산업의 속성상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낮다. 가격이 유통채널 별로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혼선을 줘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섬이 판매하는 여성복 ‘마인(MINE)’의 경우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전 만 해도 50만원대였던 재킷이 지금은 70~80만원으로 가격이 되려 오른 상태다. 따라서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오픈프라이스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마저 나오는 현실이다. ◇영세 유통업체만 피해볼 수도= 유통 업태별 가격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정부의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은 없어지고‘10원경쟁’이라고 할 만큼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고 해도 그 이상의 가격 인하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굳이 경쟁을 촉진한다면 권장소비자가격이 시행되고 있는 편의점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가격인하 경쟁이 촉진될지는 의문이다. 편의점은 대형 마트와 달리 소비자들이 ‘싼 가격’보다는 ‘24시간’가까운 곳에 문을 열고 있어 이용하는 까닭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