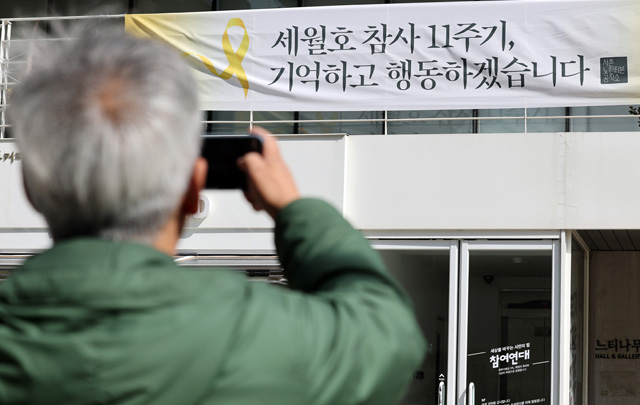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
죽기 전,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인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야 하건만,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고향도 못 가 보고 죽는게 억울한 아버지는 통일이 되기 전엔 유산 50억원을 절대 못 물려 준다고 말한다. 자식들은 50억원이 눈 앞에 아른거린다. 아버지를 위해, 50억을 위해 아들들은 통일 자작극을 벌이기 시작한다. 통일을 두고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는 점에서 영화 ‘간큰가족’은 2001년 독일영화 ‘굿바이 레닌’과 정 반대에 있다. ‘굿바이…’이 통일된 독일을 거짓말로 갈라놨다면, ‘간큰가족’은 분단된 한반도를 거짓으로 통일시킨다. 물론 베낀 영화는 아니다. 97년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공모전 당선작으로 만든 작품. 분단을 체험한 나라에서만이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다. 50억원을 노리고 벌이는 식구들의 자작극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병석에 몸져 누운 아버지는 통일소식에 씻은 듯이 병이 나았고 이들의 사기극은 커져만 간다. 단돈 1,000만원으로 자식들은 통일 신문을 찍고 통일 방송을 만든다. 통일 기념으로 개최하는 남북 단일팀 탁구대회를 만들어 내는가 하면, 평양 교예단 서커스 공연까지 감행한다. 여기에 사채업자도 끼어들도 동네 주민들도 동원된다. 거짓말이 들키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상황 설정과 장면 이음새의 어설픔이 눈에 거슬리지만,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객석과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간다. ‘굿바이…’이 통일 독일의 구석진 그늘을 블랙 코미디로 날카롭게 풍자했듯이, 이 영화 곳곳엔 통일 찬가의 쓸쓸함이 숨겨져 있다.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서 만든 사기극에도 1,000만원이 든다는 설정부터 시니컬하다. 평양 가는 고속버스 타러간 순진한 아버지에게 동네 양아치들은 지갑 털어먹기 바쁘다. 높은 정치꾼들의 공허한 말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통일의 현실이다. 그래도 영화는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휴먼 드라마’를 이야기한다. 실제 금강산에서 찍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은 통일의 무거운 메시지보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무게를 둔다. 슬랩스틱에 가까운 김수로의 코미디와 농익을 대로 무르익은 신구의 아버지 연기가 영화를 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