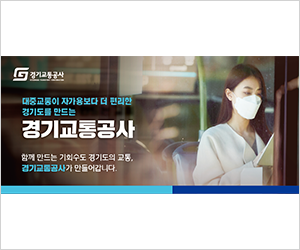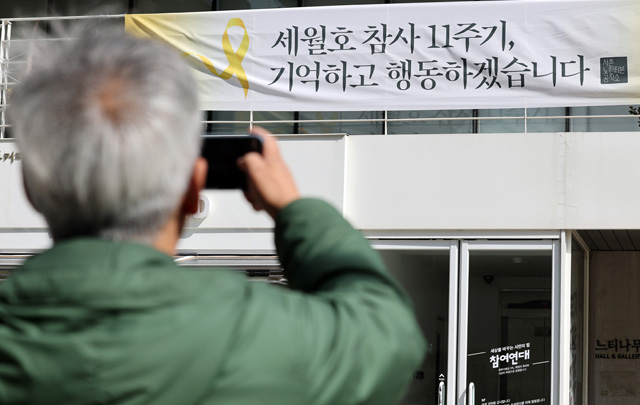특히 지난 2012년 3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평가 초점을 대표 개인 신용도에 더욱 맞출 수밖에 없게 됐다.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으로 주위 지인이나 친인척을 내세울 수 없게 되면서 보증기관 입장에서 법인 대표의 부족한 신용도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점을 방문하는 기업인 중에는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뛰어나고 건전하게 기업을 운영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본사 규정상 일선 지점 입장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싶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재기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만큼 만일 사고가 나면 보험료 상승으로 다른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보증기관들의 우려도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보증사업을 실시한 지 2년이 겨우 넘은 단계에서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며 보증을 발급하면 다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 확률이 있다"며 "아울러 공공기관 사업 수주 기준과 보증발행 기준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 수주 자체를 보증서를 발급 받는 프리패스로 간주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설명했다.
보증발행 기관들이 현실적으로 기술력을 평가할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특허받거나 공인된 기술을 보유했을 경우 보증심사위원들이 참고는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기술력을 깊이 있게 평가할 만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진 만큼 외부 전문인력에 기술성 평가를 추가로 도입해 맡기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