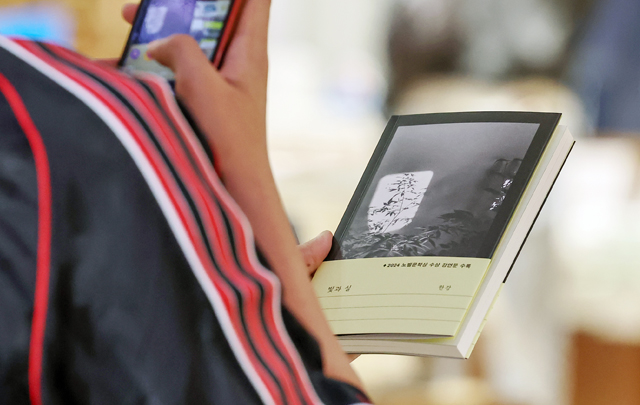한 해 마감을 불과 2개월가량 앞두고 '뒷북'을 치듯 추경을 편성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를 1월로 잡은 1957년 이래로 매년 9월3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도 무려 33회에 달했다. 추경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펴는 정책이라고 할 때 무안할 정도다.
국회는 2006년 박재완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로 국가재정법을 고쳐 추경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제한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습관성 추경증'은 수시로 도질 수 있다.
한국채권연구원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보고서도 '과연 추경이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편성되는가'라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아울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추경의 규모도 증가했고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할 때도 추경의 규모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역대 추경의 상당수는 정부나 여야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남는 돈을 쓰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했거나 반대로 고질적인 세수 예측 실패로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실행됐다고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