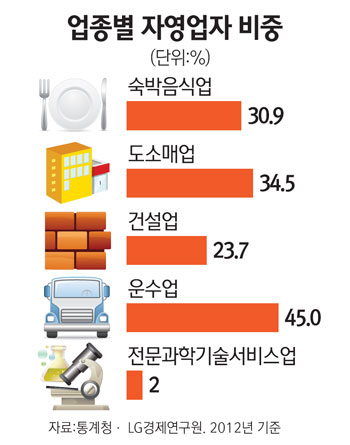|
서울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서 4년째 거주하고 있는 A(37)씨는 최근 달라진 동네 풍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ㆍ주상복합아파트를 끼고 있는 전형적인 주택가 사거리에 올 3월 이후 미용실 4개점과 휴대폰 판매대리점, 편의점이 잇달아 들어선 것.
작은 사거리 사이 직선거리 30m 내외를 두고 미용실은 기존 점포까지 합해 모두 여섯 곳으로 늘었다. 휴대폰 대리점은 세 곳, 편의점은 아파트 앞 작은 슈퍼마켓까지 포함해 다섯 곳이 됐다. 미용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제치고 동네 상권 내 최다 출점 업체로 변신했다.
최근 미용실 출점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음식점 운영이 쉽지 않고 외식 프랜차이즈 출점 역시 규제와 불황 여파로 타격을 입으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창업이 쉬운 미용실, 휴대폰 대리점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불황으로 상가 임대료가 하락한 까닭도 있지만 작은 주택가의 과다 출점으로 매출 부진에 더욱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의 미니 신도시인 풍산 지구 중심상가. 작은 호수를 끼고 있는 넓은 광장으로 산책 나온 주민을 겨냥해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치킨집 아홉 곳 중 일곱 곳이 올 들어 문을 닫았다. 2년 전 여름 치킨집 두 곳이 가게 앞에 수십개의 파라솔을 놓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자 너도나도 치킨집을 차렸다 결국 혹독한 경쟁 끝에 두 곳만 살아 남은 것이다. 나머지 일곱 곳 치킨집 주인은 큰 손해를 보고 권리금도 못 받은 채 떠났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똑같은 가게를 바로 옆에 차리는 베끼기 식 자영업 창업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차별화된 아이템과 서비스로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기는커녕 '잘되는 집 옆에 차리자'는 상도의를 무시한 '따라하기 창업'이 어느새 한국 자영업의 특징이 돼버렸다.
이 같은 행태는 국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 중부 콜로라도주의 소도시 포트 콜린즈. 캘리포니아롤과 스시류를 파는 일식당을 하는 A씨는 요즘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같은 업종의 식당을 연 한국인 B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B씨는 인근 도시에서 영업 중인 A씨 동생 가게 옆에도 같은 업태의 식당을 내 A씨 형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교민 사회에서는 B씨와 같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도의를 무시한 베끼기 식 창업이나 치밀한 준비 없이 하는 묻지마 식 창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에 나선다면 철저하게 준비해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성공 사례 전파와 교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