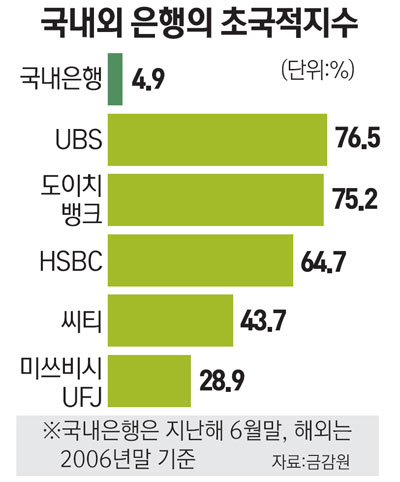|
국내 금융회사들은 최근 성장성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ㆍ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지 금융당국이 외국인 지분 한도를 비롯해 의무대출 관련 규제 등 제도적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신탁 및 간접투자 업무가 금지돼 있고 중국에서는 예대율을 75% 이하로 유지해야 위안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예 은행의 소유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외국인의 지분 한도를 최대 40%로 낮출 태세다.
보험 분야 규제도 거미줄처럼 촘촘해지고 있다.
텃밭에서 곶감만 빼먹고 나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위아래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내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진출한 태국의 경우 오는 2014년까지 신규 인허가를 주기 않기로 했고 인도네시아는 외국계 보험사가 반드시 현지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도록 했다. 중국은 최근에서야 교통사고 책임보험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계 손해보험사들에 자동차 책임보험시장을 개방했다. 최근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는 인도는 외국계 보험사의 합작투자 허용 비율이 고작 26%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금융당국과의 스킨십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중국ㆍ베트남 등지에서는 금융규제를 좌지우지하는 관료와 어떻게든 끈을 만들어놓아야 뒤탈이 없다"며 "그들의 비위를 건드려 눈엣가시로 낙인 찍히게 되면 될 것도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어찌됐든 글로벌 금융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이미 자리잡은 시장, 모든 기업들이 호시탐탐 진입하기를 손꼽는 시장일수록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시장 파이가 크다고 뛰어들어서는 본전도 못 건지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들은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 형편에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규제 내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신흥 아시아 시장에 들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전 없이 막무가내로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흥아시아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하고 금융당국이 함부로 인가도 내주지 않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영업에는 정치적 위험, 환 위험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굴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지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 ▦금융규제 환경에 대한 숙지 ▦합작방식으로 진출할 때 파트너와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다양한 판매 채널 확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며 철저한 준비를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