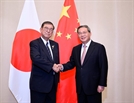금융 당국 관계자는 20일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자 중 현재까지 개별 기관에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은 약 310만명"이라면서 "채무불이행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7년이 지나면 연체기록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남아 있어 경제활동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낙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원년인 1997년 말 3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143만명이었다.
신용불량자는 위기의 여진이 본격화한 1998년 236만명으로 1년 새 65.0% 급증했다. 1999년 말에도 235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자활에 성공했지만 상당수는 외환위기 때 빠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정한다.
외환위기에 이어 터진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도 2004년 4월 기준으로 126만명에 달한다. 이들도 선별구제 대상으로 검토된다.
이들 가운데 52만명은 '희망모아'라는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정리기관)를 만들어 채무를 재조정했지만 나머지 74만명은 역시 금융권에 연체기록이 남아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연체기록을 지운다고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다소 높아지면서 금융권 접근이 쉬워진다"면서 "주로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자영업자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