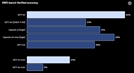|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예금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이제 1% 예금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금리가 5%일 때 매년 1,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으려면 2억원이 필요하다. 금리가 2%면 5억원이 있어야 하고 1%면 10억원이 있어야 한다. 저금리에서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노후에 필요한 금융자산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산운용은 더 빠른 속도로 차질을 빚는다.
금리가 계속 하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금에 머물러 있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면 이러한 행태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금리로 운용해서는 노후 생활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점차 투자자산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트라우마도 많이 사라진 상태다. 이런 변곡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투자자산으로 옮겨가면서 국내에만 '몰빵'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수출국가이며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을 보면 1990년 이래 25년 동안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주가가 그런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만도 25년을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 대만 펀드시장은 국내주식형이 아닌 해외채권형의 비중이 높다. 우리도 10년이 지나 '아차'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가야 한다.
둘째, 각국의 주가는 길게 보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나라에 분산을 해야 한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만 보더라도 1990년 이후 미국 주가는 계속 올랐지만 일본 주가는 하락했다. 선진국 간에도 이런 지경이니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주가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다. 큰 충격이 오면 주가가 같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보면 다양하게 움직인다. 각국의 주가 동조화라는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셋째, 지금 상황에서 해외로 분산하는 것은 마치 콜옵션을 사는 것과 같다. 세계 주가는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주가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세계 주가는 상승하지만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만이 아니라 해외주식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을 국내 주식에만 모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마치 프리미엄 없이 콜옵션을 일정 부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자산으로 자산운용을 변화시킬 때 가장 선행돼야 할 조건이 해외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해외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주식의 자본차익 비과세와는 달리 해외주식의 자본차익에 과세하는 현 제도는 국내와 해외 간의 자산배분을 국가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