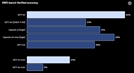|
올 초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에 이어 최근 모뉴엘 사태까지. 매출채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은행의 여신 집행과 점검, 감리 시스템 전반에 비판이 거세다.
표면적으로는 대출 보증과 대기업 변제능력만 믿고 허술한 여신심사를 한 은행에 1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더 파고들면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일단 은행들은 대출 이후 기업의 동향 파악에 등한했다. 부처 간 공조도 낙제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 모뉴엘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파악했지만 금융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근시안적 실적주의를 숨은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많다. 정책당국이 기업대출을 단기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으면 모뉴엘과 흡사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시계열상 여신기업의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허술함을 보여준다"며 "여기에 부처 간의 정보독점 욕구, 정책당국의 밀어내기식 대출 압박 등이 총체적 부실을 합작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허술한 심사·여신 점검 체계가 원인…전형적 인재=서류 중심의 여신심사는 사기대출의 직접적 빌미가 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의 수출실적 확인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했고 은행도 매출채권의 진위보다는 보증서만 보고 대출을 해줬다. 1차 검증부터 부실하니 다음부터는 사상누각이 된다.
하지만 더 염려되는 것은 은행의 여신관리 능력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무역금융을 정교하게 다듬어도 은행 여건상 현장점검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대출 집행 이후 기업의 이상징후를 제대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뉴엘의 경우 로봇청소기 업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투기등급을 받은 점, 홈쇼핑에서 주력제품을 끼워팔기 한 점 등 결정적 징후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실제 우리은행은 모뉴엘의 매출채권 잔액(152억원·2011년말 기준) 대비 매출채권 할인금액(2,005억원)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여신을 회수했다. 대형 은행의 한 고위임원은 "튀는 데이터를 골라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면 여신 담당직원 개인의 역량에 모든 것을 기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부처 간 협업 필요, 대출 실적주의 지양해야=금융당국은 국세청이 가공매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부각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우리 쪽에 (가공매출) 사실을 알려준다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기 기관의 목적(세금탈루 추징)을 달성하면 다른 정보는 오픈하지 않는 게 관례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세정당국과 적극적 공조가 있었다면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과세정보 공유 등 민감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금융에 대한 차분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 실장은 "기술이 과대 포장된 모뉴엘 사태는 기술금융의 실패 사례"라며 "정부가 대출 성과에 급급해 은행을 몰아세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